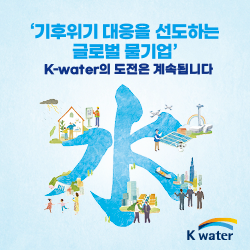세계 기후단체, G7 재무장관들에게 공개서한, 한국의 화석연료 확장 금융에 대한 압박
화석연료 공적금융 세계 1위 한국 ”탈화석, 친재생 에너지 금융정책 전환하라“ 요구
주요 7개국은 화석연료 금융 중단 약속, 한국은 화석연료 금융 지원을 지속
30개 국내외 기후환경단체가 오는 24일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각국 장관들에게 한국의 화석연료 확대 정책에 대한 압박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17일 발송했다.
단체들은 이번 서한을 통해 의장국인 이탈리아 정부를 비롯한 주요 7개국에 한국의 화석연료 금융 중단과 CETP(Clean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가입을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단체들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청받은 이번 G7 회의를 앞두고 발송한 공개서한에서 “한국의 공적 금융이 화석연료 투자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라고 꼬집으며 “한국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계 기후단체는 서한에서 “2023년에는 세계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은 바 있으며,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의 치명적인 폭염과 산불, 아시아의 전례 없는 홍수 등 자연재난은 화석연료와 작별을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은 기온 상승 1.5도 제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2050년에는 배출량에서 흡수한 양을 뺀 순배출량이 0(넷제로 Net Zero)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전 세계는 화석연료 금융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 26)에서는 정부가 후원하는 화석연료 금융 중단 및 청정에너지 전환을 뼈대로 CETP를 출범시켜 현재 미국·EU·영국·호주 등 세계 41개국이 참여 중이다. 이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 등 주요 7개국은 2022년 정상회담에서 유사한 수준의 화석연료 투자 중단 정책에 약속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세계 에너지 전환 노력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미국 소재 기후 연구단체 오일 체인지 인터내셔널(Oil Change International)의 2020~2022년 통계를 보면 한국은 연평균 100억 달러(약 13조 원)가 넘는 공적 금융을 화석연료에 투자하면서 주요 20개국(G20) 국가 가운데 캐나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전년도 분석(2019년~2021년) 당시 한국은 캐나다와 일본에 이어 3위였는데, 올해는 일본을 제치고 한 단계 올라선 것이다. 같은 기간 한국은 청정 에너지에 대한 공적 금융 투자 규모가 8억 5천만 달러(약 1조 1500억 원)로, 화석연료 투자에 비해 13분의 1에 불과한 것과 달리 일본은 청정 에너지의 투자 규모(약 3조 1000억 원)가 한국보다 3배 가까운 규모이다.
한편, 7개국 정상은 2022년 독일 회의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로 다짐한 데 이어 2023년 일본 정상회의에선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저감 조치를 하지 않은 화석연료 발전은 퇴출하겠다는 합의에 이른 바 있다.
주요 7개국은 지난달 30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장관 회의 뒤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부 폐쇄하겠다”고 결의했다.
전 세계가 에너지 전환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시민단체의 G7 장관에 대한 공개 서한은 한국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기후솔루션 오동재 석유가스 팀장은 "막대한 화석연료 금융으로 전세계 화석연료 확장을 견인 중인 한국이 지금의 투자 기조를 유지하는 한,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한국이 설 자리는 줄어들 것"이라며 "조속한 화석연료 투자 제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