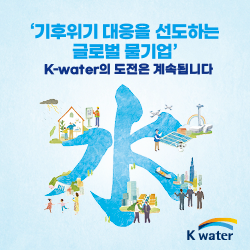환경부는 26일 중국 옌타이시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정부 관계자와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10회 한중일 환경산업 원탁회의(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TREB10)’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7일에서 28일까지 열리는 제26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he 26th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Korea, China, Japan, TEMM26)의 부대행사로 마련되며, 3국의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 탄소중립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 △녹색금융 △순환경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정책 및 실천 사례 △환경기술 국제협력 등 4개 세부 의제에 대해 3국 정부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인 ‘녹색금융의 역할’ 발표에서 이옥수 김앤장법률사무소 지속가능성기후센터장은 “최근 ESG 추진속도 완화 추세로 전 세계 지속가능채권 발행은 위축됐지만 재생에너지, 수소·전기차 등 기후기술 투자는 오히려 2배 이상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과 전환금융 지침서(가이드라인) 도입이 기업의 녹색·전환 투자 수요를 뒷받침할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그는 “녹색금융의 진정한 역할은 단순한 ‘라벨링’이 아니라 고탄소 활동은 배제하고, 무탄소 경제활동으로 자금을 흐르게 만드는 것”이라며, “친환경위장 위험(그린워싱 리스크) 관리가 앞으로 기업과 금융 모두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인 ‘순환경제 실천사례’ 발표에서 이유진 엘지화학 지속가능담당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자원화와 순환경제 전환을 통해 기업의 ESG 가치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자사의 순환경제 혁신사례를 소개한다.
세 번째 주제인 ‘ESG 정책 및 실천 사례’ 발표에서 김연주 한국수자원공사 대리는 물 순환 자원의 재생에너지 활용과 기후적응 전략을 결합한 물 기반 친환경 경영 실천 방안을 발표하며, 수자원 분야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탄소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공유한다.
네 번째 주제인 ‘환경오염방지기술에 대한 국제협력 사례’ 발표에서 장원석 효성중공업 부장은 “해상풍력은 기후위기와 시장의 위험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며 효성이 중국 상해전기와 추진 중인 해상풍력 국제협력 사례를 발표한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화넝 옌타이 바자오 열병합발전소 미세조류 탄소저감 신규사업(프로젝트)’ 현장을 방문, 미세조류를 활용해 발전소의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흡수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기술을 시찰한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정부와 산업계가 녹색금융·순환경제·ESG·환경기술 협력에서 구체적 실행 사례를 공유해 동북아 지역이 세계 탄소중립 전환을 선도하는 협력 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화넝 옌타이 바자오 열병합발전소 미세조류 탄소저감 프로젝트(Huaneng Yantai Bajiao Thermal Power Plant Microalgae Carbon Sequestration and Cogeneration Project)’는 중국 산둥성 옌타이 바자오 지역에서 추진 중인 발전분야 녹색 및 저탄소 전환 시범사업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국영 전력기업인 중국화넝그룹(China Huaneng Group)이 운영 중인 바자오 열병합발전소 내 설치·운영 중에 있다. 이는 전력실, 종자 보존실, 실험실, 미세조류 탄소 격리 구역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발전소의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미세조류가 흡수해 탄소를 고정하도록 설계됐다.
미세조류는 광합성 효율이 높고, 일반 육상식물 대비 10~50배의 이산화탄소 고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탄소’를 먹고 자란 미세조류는 바이오 비료와 바이오 사료 등 생산에 활용돼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