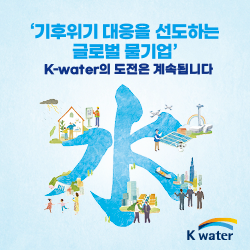정부는 ‘AI 3대 강국’, ‘아시아 최고 AI(인공지능) 허브’를 내걸고 AI 인프라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에는 1000MW급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세종·용인·부산·시화 등 전국 곳곳에 수십에서 수백 MW급까지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세계 전력시장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데이터센터·AI·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2022년 460TWh였던 관련 전력소비가 2026년 많게는 1000TWh 수준까지 치솟을 것이라 전망한다. 불과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AI와 암호화폐가 “전기 먹는 하마”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것이다.
정부와 전력당국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에서 데이터센터 전력소비가 2038년 기준 연간 15.5TWh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는 한국의 440만 가구가 1년 동안 쓸 전기를 데이터센터가 추가로 가져가는 셈이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AI 연산, 클라우드 서비스, 블록체인·암호화폐 처리에 쓰일 전기다.
◇ 늘어나는 전기 감당할 수 있나?
문제는 이렇게 늘어나는 전기를 무엇으로, 어디까지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감원전”, “재생에너지 확대”를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노후 원전의 운영 연장을 잇달아 허용하거나 추진 중이다.
11차 전기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여름 최대부하 기준으로 2038년 6.2GW까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중 4.4GW는 기존 추세를 넘어선 ‘추가’ 수요로 따로 잡았다. 전기차·수소환원제철·전기로 전환·수소 생산 등 ‘전기화’로 인해 늘어나는 전력을 합치면, 추가수요가 16.7GW에 달한다. 숫자만 놓고 보면, AI·데이터센터·전기화가 앞으로 전력수요 증가의 대부분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런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 쪽 그림은 겉보기엔 단순하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 발전 비중을 대략 원전 35%, 재생에너지 29% 정도로 가져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표현은 “석탄을 줄이고, 재생을 늘리되, 원전은 감원전 기조를 유지한다”는 기존 입장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조합이다.
그러나 원전 35%를 채우기 위해 설계수명이 끝난 고리2호기는 10년 더 돌릴 수 있게 계속운전 허가를 받았고, 그 뒤를 이어 고리3·4, 한빛1·2, 한울1·2, 월성2·3·4 등 9기 노후 원전이 수명연장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당초 계속운전 대상으로 거론된 10기 중, 지금까지 문이 열린 것은 고리2호기 한 기뿐이지만, 나머지 9기까지 모두 허용될 경우 “새 원전을 더 짓지 않는다”는 말과 관계없이 한국이 원전에 기대는 기간과 발전량은 사실상 크게 늘어난다.

그럼에도 정부의 공식 메시지는 여전히 ‘감원전’이다. “탈원전은 아니지만, 원전 확대도 아니다”, “원전·재생·가스가 함께 가는 에너지 믹스를 추구한다”는 문장이 반복된다. 새로운 대형 원전 건설은 당분간 미루고, 기존 원전은 안전성 심사를 전제로 가능한 한 오래 돌리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에너지안보, 전기요금,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맞추려다 보니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또한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추가수요 16.7GW를 맞추는 과정에서, 원전·재생·가스 가운데 어느 쪽에 얼마만큼의 역할을 맡길 것인지에 대한 전력전략이 공백이다. 어느 발전원을 몇 GW나 더 늘릴지,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데이터센터·전기차·산업 전기화 수요를 어떤 조합으로 감당할지에 대한 원칙과 우선순위는 공개된 논쟁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AI 시대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을 줄일 것이냐 말 것이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데이터센터에서 밤낮없이 돌아가는 GPU, 설계수명을 넘겨 연장 운전 중인 원자로, 그 아래를 흐르는 송전선, 그리고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드는 시민의 삶이 이미 한 몸처럼 얽혀 있기 때문이다.
“AI 시대를 국가전략으로 삼겠다면, 그 전기를 무엇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부터 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데이터센터와 암호화폐 산업이 만들어낼 1000TWh 시대의 전력수요, 한국 데이터센터가 추가로 쓰게 될 15.5TWh, 그리고 13년 뒤 원전 35%라는 숫자 사이의 빈칸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모호한 감원전 구호를 넘어,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 산업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답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