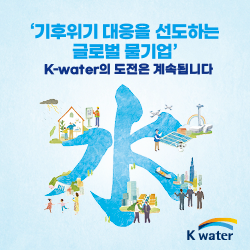겨울 골목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븡어빵을 굽는 손길은 한국인의 정서를 상징한다. 아이의 손에 쥐어진 붕어빵 하나에 가족의 온기가 녹아들고, 길가의 노점에는 삶의 향기가 스며 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그 달콤한 팥 향이 인공의 냄새로 바뀌었다.
“국산 팥이 귀해서요” 붕어빵 장수가 던지는 한마디는 우리 농업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압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누가 뭐래도 팥의 본향이다. 지역별로 생산량 차이가 있고 잎마름병 등 병충해에 취약하다고 하지만 대개 배수가 잘되는 사질 토양 어디서나 잘 자란다. 생산량 차이가 나고 병충해에 취약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인공비료, 농약을 쓰면서 우리 스스로가 불러온 결과다.
인공비료와 농약이 없던 시절 우리 조상들은 팥을 자연의 이치대로 길렀다. 논두렁이나 밭둑, 김매기가 끝난 자투리땅에 심었다. 따로 비료를 주지 않아도 잘 자랐다. 팥은 뿌리에 생긴 뿌리혹박테리아와 공생하며 이곳에서 스스로 질소를 고정하여 질소비료를 만들어 성장하는, 그야말로 자연의 순환을 돕는 작물이다.
그래서 비옥한 땅보다 척박한 땅에서 단단하고 맛있는 팥이 열렸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인공비료의 농약이 보급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과잉 질소는 팥의 생육 균형을 깨뜨렸고, 병충해를 부르는 환경을 만들고 말았다. 농약을 치면 일시적으로 해결되지만 해충의 저항성은 더 강해진다. 그리고 흙 속 미생물이 죽거나 줄어들고, 뿌리혹박테리아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팥은 약에 의존해야만 살아남는 작물이 되어 버린 것이다.
세계인들에게 붕어빵을 제대로 맛보이게 하려면 우리 땅을 되살리는 일부터 해야 한다. 뿌리혹박테리아가 다시 살 수 있는 토양이어야 진짜 팥이 자라니까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1. 화학비료의 절감과 유기물 복원- 퇴비 녹비 작물, 낙엽 등을 이용해 미생물이 살아 있는 흙으로 복원해야 한다.
2. 품종의 토착화-지역 기후에 맞는 전통 품종을 다시 찾아내고 종자 보존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3. 순환농업의 적용-윤작 작물로 팥을 심어 토양의 질소를 순환시키는 농법을 장려해야 한다
4. 소규모 협동 재배 체계 구축-개별 농가가 아니라 마을 단위로 토양, 병충해 정보를 공유하며 친환경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팥은 원래 강한 작물이다. 약을 주지 않아도 손길이 거칠어도 땅이 살아있으면 스스로 잘 자란다. 그렇게 자란 팥이야말로 우리의 공기, 물, 토양 속 미생물과 공생하며 우리의 맛과 향을 머금게 된다. 때문에 팥의 본질은 기다림과 정성, 그리고 흙의 향기인 것이지, 단맛이 아니다.
붕어빵이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모양이나 달콤함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 달고 모양이 좋은 간식은 널리고 널려있다. 아마도 작은 틀 속에 구워지는 정(情)과 여유, 붕어빵 속에 든 팥의 진정한 맛과 향기에 끌렸기 때문일 것이다.
붉은 씨앗의 르네상스, ‘팥의 제국’은 멀리 있지 않다. 붕어빵의 단맛이 아니라 우리 땅의 단맛을 지키며 팥을 심는 어느 농부의 손끝에 있으며 가공 기술이나 마케팅 못지않게 미생물 기반의 친환경 농업으로 흙을 살리는 순간에 있다. 작지만 강한 씨앗, 팥의 부흥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