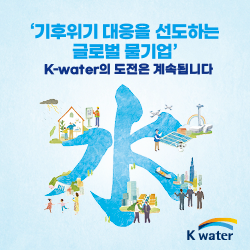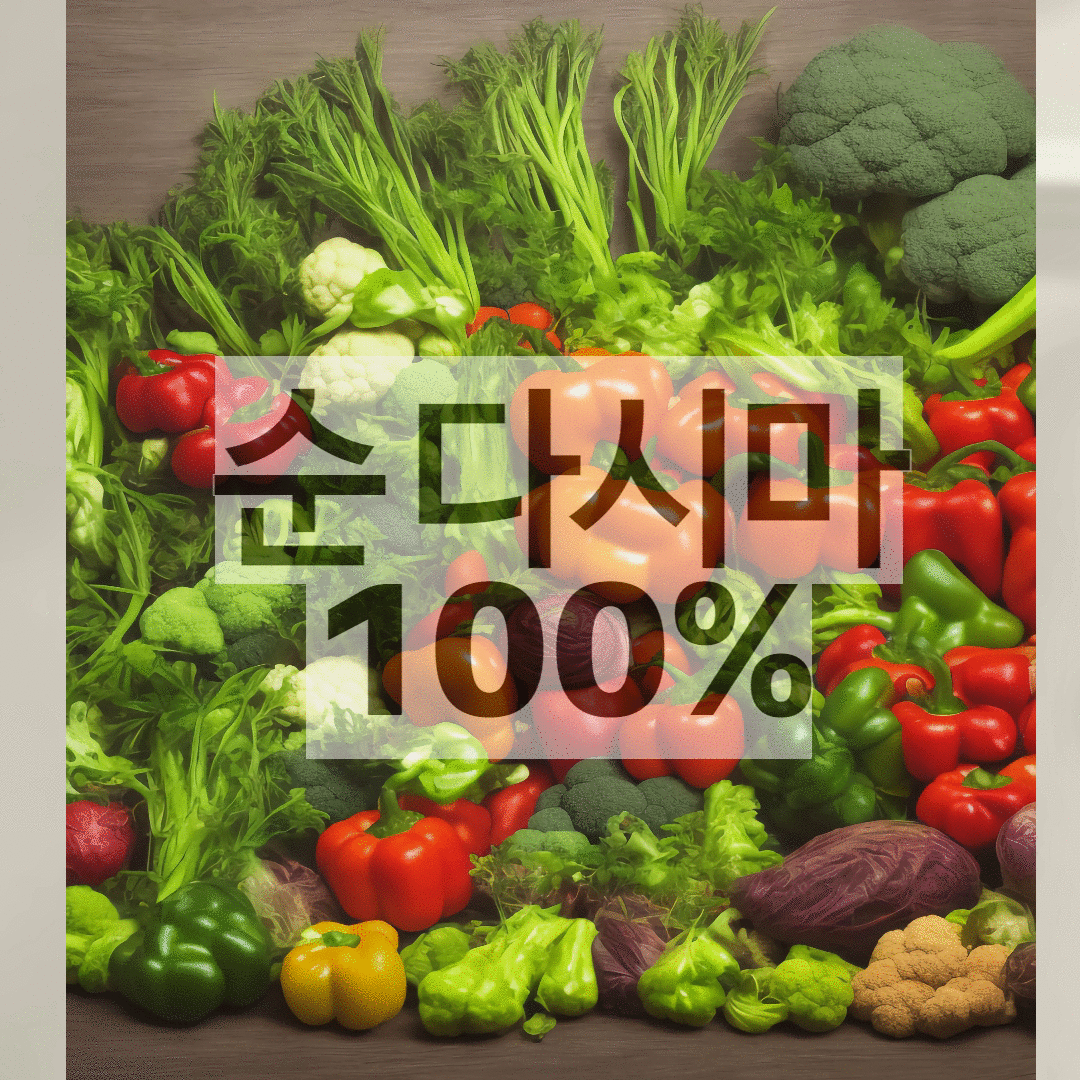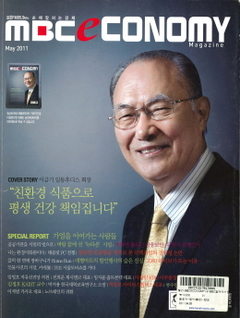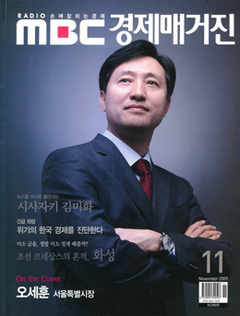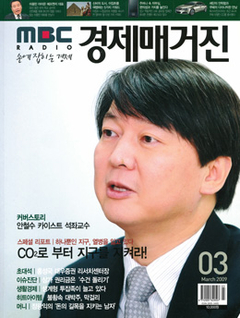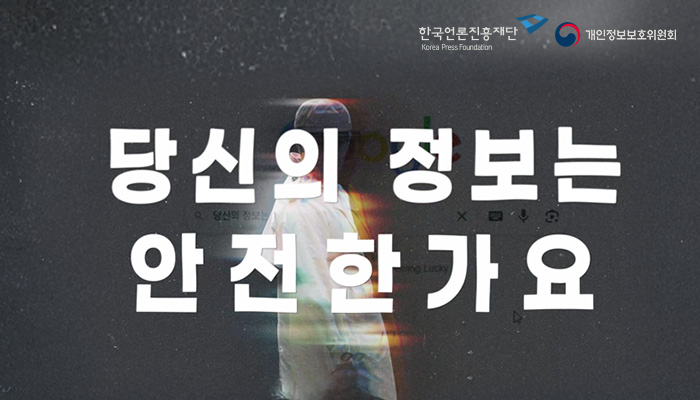인공지능(AI) 시대에 필수적인 인프라가 바로 데이터센터다. 테이터센터는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 IT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장비를 한 건물 안에 모아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통합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클라우드 서비스와 AI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인프라다.
기존에는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이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서 주로 활용됐다. 현재는 쳇GPT와 같은 생성형 AI 산업이 활성화 되면서 더 많은 데이터센터가 필요하게 됐다. AI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업들은 더 많은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데이터센터 건립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17일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서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사회간접자본(SOC)로 규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데이터센터의 핵심 요건인 전력 공급과 운영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24시간 365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전략이 공급돼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열을 식혀야 해서다.
◇ GW급 전력량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센터 뜬다
지난 7월 14일(현지시각) 마크 저커버그 메타플랫폼(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스레드에 여러 개의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중 첫 번째가 될 데이터센터는 ‘프로메테우스’로 명명하고 규모는 GW(기가와트)급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W급은 원자력 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규모의 전력 단위다. 현재 대부분의 데이터센터는 수백 MW(메가와트)급 수준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에서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 기업용 서버 관리 기업 오라클 등 일부 기업만이 GW급 데이터센터 개발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AI 선두자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도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수 차례 공언한 바 있다. 국내 여러 언론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15일(현지시간)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1회 ‘펜실베니아 에너지·혁신 서밋’ 연설에서 “오늘 오후 업계 선두인 20개 기술 및 에너지 기업들이 펜실베니아주에 920억 달러(약 127조원)가 넘는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며 “펜실베니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투자”라고 소개했다.
AI 훈련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한 신규 프로젝트에 360억 달러 이상, 데이터센터 등에 전력을 공급할 에너지 인프라 부문에 56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각각 이뤄질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데이터센터 관련 부문별 투자 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자체 시설 건립보다 전력을 공급할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 삼성물산·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 고효율 냉각 기술 적용 실적 보유
전력 공급 이외에도 데이터센터 운영은 막대하게 발생하는 열을 냉각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건설사들도 관련 냉각 기술을 개발하는 중이다.
시장조사업체 아리즈튼(Arizton)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 냉각 시장은 2030년 407억 달러(약 55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냉각 기술을 가진 기업은 데이터센터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건설사 중 데이터센터 건설에 성과가 있거나 핵심 냉각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으로 압축된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슈퍼컴 센터, 화성 HPC 센터 등 10여 개의 데이터센터 시공과 함께 국내 건설사 최초로 티어 4 최고등급을 인증 받은 사우디 타다울타워의 데이터센터 등 국내외 데이터센터 수행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지스자산운용이 경기도 안산에서 개발하는 초대형 데이터센터인 안산 글로벌 클라우드센터 사업을 수주했다.
또한 삼성물산은 이러한 데이터센터를 직접 건설하면서도 핵심 냉각 기술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2월 국내 냉각기술 전문기업인 데이터빈과 협업해 데이터센터의 핵심 인프라 설비인 차세대 냉각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번 냉각시스템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 액체에 서버를 직접 담가 열을 식히는 액침냉각 방식이다. 공기나 물을 사용하는 기존의 냉각 방식 대비 높은 효율은 물론 전력소비가 낮아 차세대 열관리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미국이나 스페인 등 글로벌 업체가 기술을 보유하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업체가 데이터센터에 필수적인 차세대 핵심 인프라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네이버, LG CNS, NH통합 IT 센터 등 다수의 데이터센터 시공 경험을 통해 냉각 기술의 신뢰성과 노하우를 축적했다. 2023년 11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네이버의 ‘데이터센터 각(閣) 세종’에 차가운 자연 공기를 활용해 서버의 배기열을 낮추는 고효율 하이브리드 냉방 시스템을 적용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고효율 냉각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수주 경쟁에서 큰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 냉각 시스템이 30~40%를 차지하며 AI 및 고성능 컴퓨팅 워크로드 증가로 고밀도 서버의 열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AI 칩(GPU)는 랙당 50kW(키로와트) 이상의 전력을 소모하며, 기존 공랭식 냉각으로는 열 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고효율 냉각 기술이 필수적이다.
알다 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AI 3대 강국’을 제안했다. 이런 만큼 이 정부도 민간의 데이터센터 건설 기술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적도 않다. 막대한 전력을 공급해야 하고 운영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열을 식히는 기술도 개발해야 한다. 향후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전력 공급 계획과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들여다 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