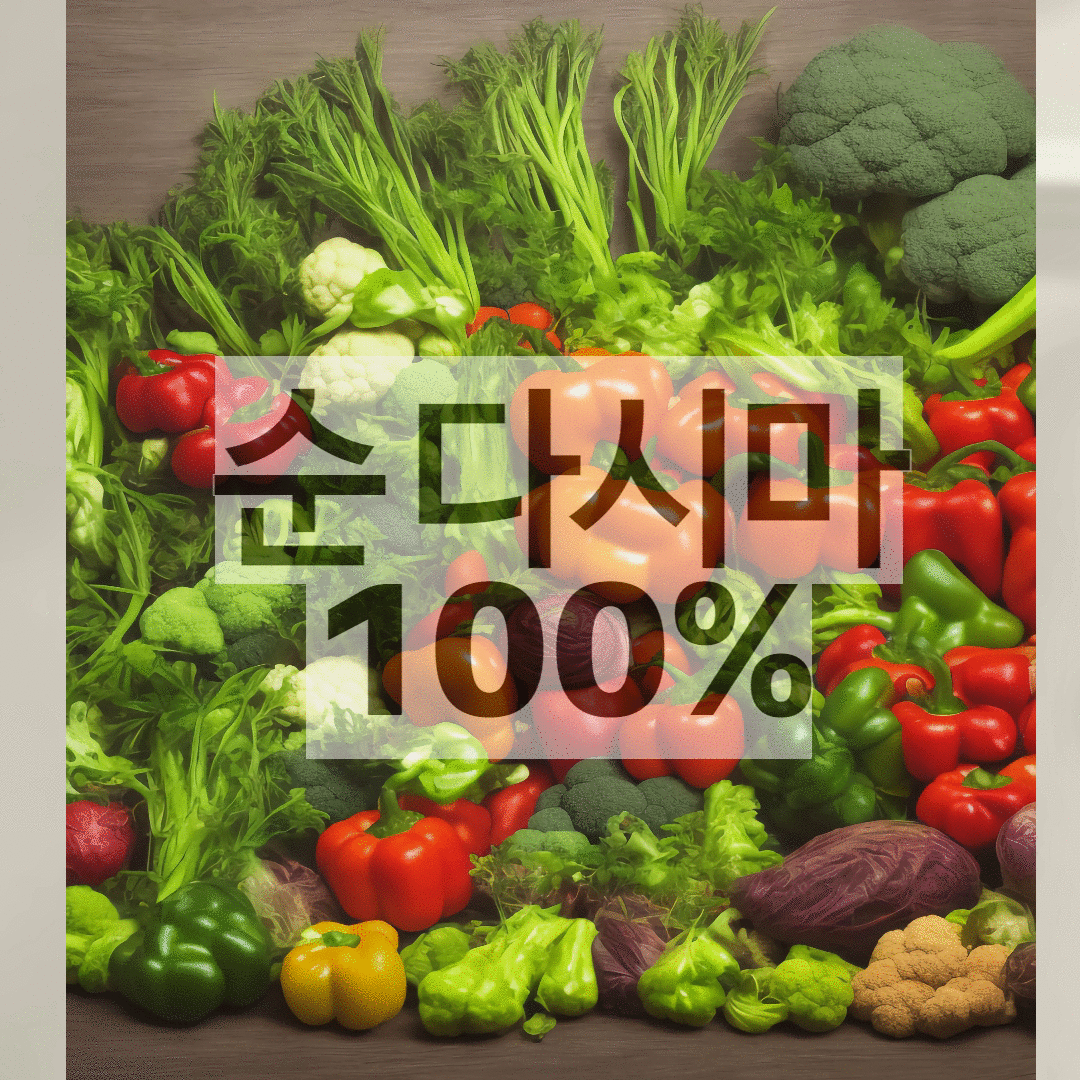많은 이들은 인공지능을 차세대 산업으로 부른다. 그러나 냉정히 보면 인공지능은 기존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하고 가공하는 기술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산업 현장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그렇다고 인공지능 기술을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라고 부르기에는 왠지 찜찜한 구석이 있다.
이를테면 올해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일본 오사카 대학의 사카구찌 교수가 처음 발견한 T세포(regulatory T cells, Tregs)”는 류머티즘, 당뇨, 장기이식 거부반응 등 자가 면역질환이나 암 면역치료를 이해하고 새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큰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올해 노벨 화학상을 받은 스스무 키타가와 (일본), Richard Robson (영국), Omar M. Yaghi(미국) 등 세 화학자가 개발한 “금속-유기 골격체(Metal-Organic Frameworks, MOF)”라는 새로운 물질은 환경 문제, 에너지 저장, 정밀 촉매 설계 등 현대 화학·공학 분야의 여러 난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또한, 미세구조를 조작해 물질의 성질을 바꾸는 나노기술이라든가, 활성질소수(活性窒素水)를 만들어 친환경 농업혁명을 꿈꾸는 인공번개 기술 등은 인간이 몰랐던 자연의 원리를 찾아내거나 완전히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 기반해 전혀 다른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혁신적 기술이 자본주의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진짜 신기술이다.
이에 비하면 인공지능은 기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에 가깝다. 물론 이 도구의 파장은 적지 않다.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이 금융, 유통, 교육, 의료계 깊숙이 들어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산업을 재편하는 기술이지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는 게 아니다. 데이터라는 자원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정교하게 쓰도록 돕는 기술일 뿐이다.
자본주의는 늘 신기술의 탄생→생산방식의 혁신→시장의 확대라는 순환을 통해 성장해 왔다. 항구도시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교역망, 산업혁명의 엔진(기계), 전기의 대중화, 반도체의 발명 등등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경제는 구조를 바꿨고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가 만들어졌다. 이 질서에서의 기술은 자본주의의 피에 산소를 공급하는 호흡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호흡이 끊기려 하는 순간이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산업 등은 이미 지난 70년대부터 시작돼 성숙할 대로 성숙했고 중국으로부터 추월을 당하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에 의한 신산업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자동화 도구를 얻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기초과학적 발견을 동반한 신기술이 아니다. 오히려 인공지능 때문에 새로운 발견이 사라지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자본주의의 진화를 견인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과거의 데이터와 산업 위에 올라탄 또 하나의 효율적인 기술로만 남을까? 대답은 자본주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분명해진다.
하버드대의 역사학자 스벤 베케르트의 『자본주의』라는 책에 따르면 예멘의 항구에서 시작된 자본주의의 초기 형태는 기존 세계를 관통하는 새로운 연결 원리를 발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기에 새로운 물질, 새로운 발견이 등장하면서 자본주의라는 유기체가 숨통을 텄고 시장과 산업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더 빠른 계산 능력을 갖췄다. 인공지능이 기획해 주고 글을 써주고 무엇이든 답해 준다며 이곳저곳에서 칭찬과 경탄해 마지않는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새로운 산업은 새로운 물질,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생명공학, 새로운 자연 원리가 열릴 때 비로소 탄생한다.
그러므로 일자리가 생기고 다 같이 번영하는 진정한 자본주의의 다음 장(章)은 여전히 땀을 흘리는 실험실과 연구소, 그리고 과학적 발견의 길 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길이 다시 열릴 때 비로소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미래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