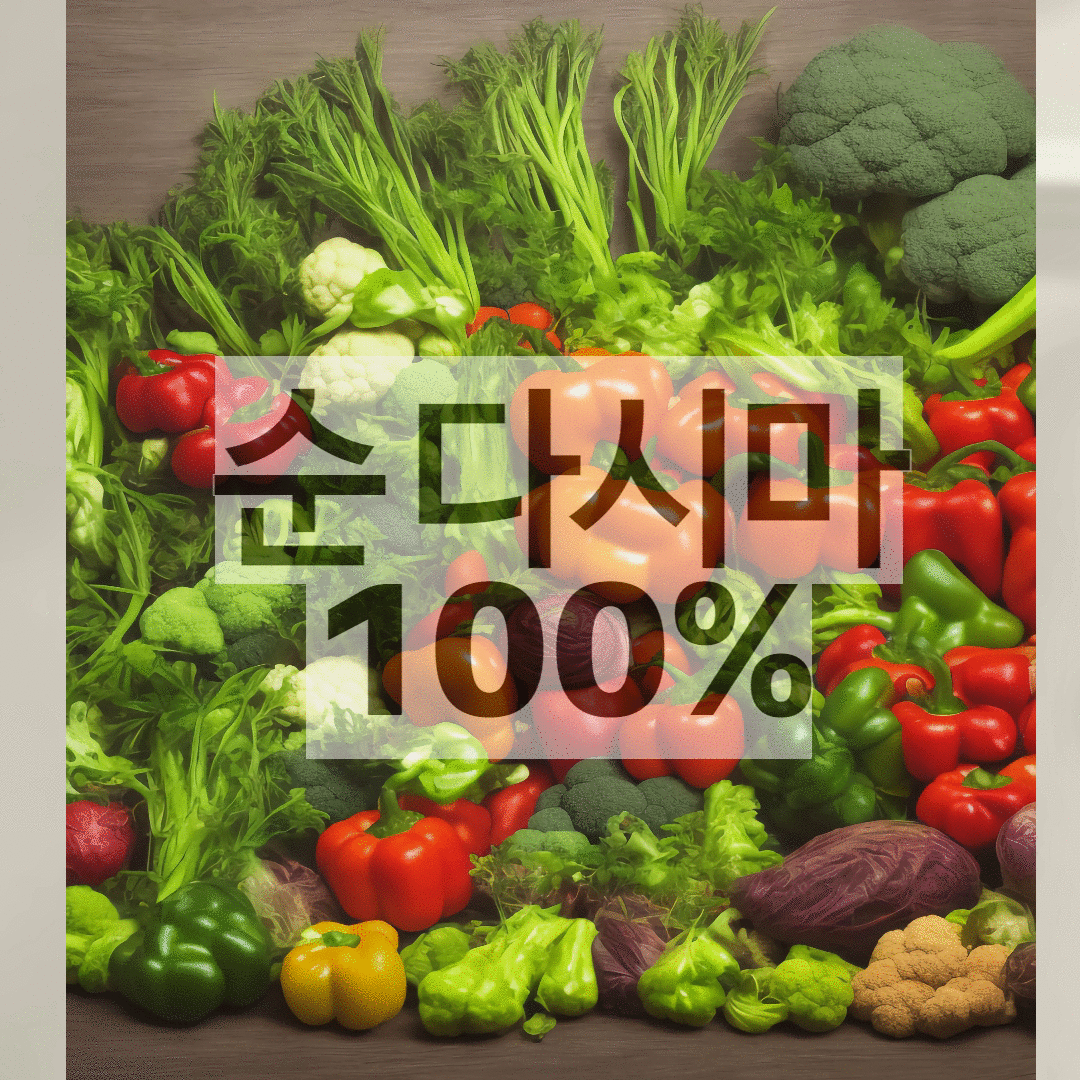농림축산식품부가 올 하반기부터 프랑스의 ‘르 꼬르동 블뢰(Le Cordon Bleu)’처럼 한식 교육의 세계적인 기준이 되는 ‘수라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거주 외국인 조리사, 조리 전공자, 그리고 대중적이고 실무적인 외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식을 글로벌 미식의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기보다 민간 교육기관을 공모·선정하여 각 기관의 특색을 살린 전문 교육을 한다고 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상세 모집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나 한식진흥원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해외에서건 국내에서건 한식의 이름으로 팔리는 음식이 제각각이고, 그중 상당수가 ‘한식 풍’에 그친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그 취지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한식은 ‘손맛·칼맛·불맛’이라는 아날로그적 설명이 격에 맞는 것처럼 여겨 왔다. 이는 장점인 동시에 약점이다. 하지만 계량화되지 않은 감각의 언어로는 국경을 넘는 순간 표준이 되기 어렵다.
해외에서 한식을 배우는 이들에게 “대충 이 정도” “불 조절은 느낌으로”라는 설명은 재현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각자의 해석이 덧붙여지고, 한식은 빠르게 변주되며 원형과 멀어진다. 세계화의 걸림돌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된다.
반면 글로벌 절대 표준을 갖춘 가운데 제한적 현지화에 성공한 맥도널드, 커피의 맛, 프로세스, 그리고 경험을 표준화한 스타벅스, 11가지 허브와 스파이스라는 절대 변경 불가 영역을 설정하고 표준화한 KFC, 피자를 요리가 아닌 조립 제품으로 정의한 도미노 피자, 제품 규격과 동선을 표준화한 이케아푸드 등은 교육과 인증을 표준 위에서 작동시킨 대표적인 회사들이다.

세계 최대 회전초밥 체인인 푸드앤라이프 (스시로), 쿠라스시, 하마스시 등 일본의 초밥 빅3사도 빠질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프랑스 요리는 소스의 계보와 조리법을 문서로 만들었고 이탈리아 요리는 재료의 원산지와 조리 규범을 정리했다. 일본 역시 ‘와쇼쿠(和食, 일본의 식사)’를 2013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전, 기본 육수와 칼질, 조리 공정을 촘촘히 정리했다.
손맛을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그것이 발현되기 전의 공통 토대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예컨대 와쇼쿠와 함께 같은 해 유네스코에 등재된 김치도 발효 기간의 범위, 소금 농도의 기준, 배추와 무, 그리고 젓갈의 역할과 대체 가능성까지 과학적인 수치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 불맛 역시 화력의 세기와 조리 시간의 표준 범위를 제시할 수 있다.
칼맛은 더더욱 그렇다. 재료 손질의 크기와 두께는 식감과 조리 시간을 좌우한다. 이런 기본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시작하면, 교육은 ‘각자의 한식’을 양산하는 통로가 될 뿐이다.
수라 학교가 성공하려면 커리큘럼의 절반은 조리 실습이 아니라 표준의 이해에 할애돼야 한다. 레시피를 알려주는 교육이 아니라, 왜 이 공정이 필요한지, 제대로 된-즉 기준에 맞는 재료를 어떻게 찾고 고르는지부터 교육하고 훈련해야 한다. 그러한 기준이 서야 현지 사정에 맞는 응용이 가능해지고, 그 응용이 한식의 이름을 훼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표준은 족쇄가 아니라 안전띠다. 그 안에서 각자의 손맛이 살아난다.
또 하나 짚고 싶은 대목은 미디어 교육이다. 미디어는 레시피를 대중화시키는 가장 빠른 통로다. 잘못 전달된 한 컷의 영상, 과장된 한 줄의 설명은 순식간에 ‘정답’이 된다. 만약 미디어 관계자도 교육 대상에 포함된다면 그래서 더욱 엄격해야 한다.
조리법의 맥락과 문화적 배경, 용어의 정확성을 함께 다루지 않으면 오해는 증폭된다. 한식을 ‘쉽게’ 전달하는 것과 ‘틀리게’ 전달하는 것은 한 끗 차이다.
한식은 충분히 세계적이다. 이미 K-푸드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세계가 지켜야 할 한식의 기준이 정리되지 않았을 뿐이다. 손맛과 불맛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수치로 정확히 설명하는 일이다.
기준을 세우고 오와 열을 맞춘 뒤에 교육을 시작하자. 그래야 우리가 지키려는 한식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