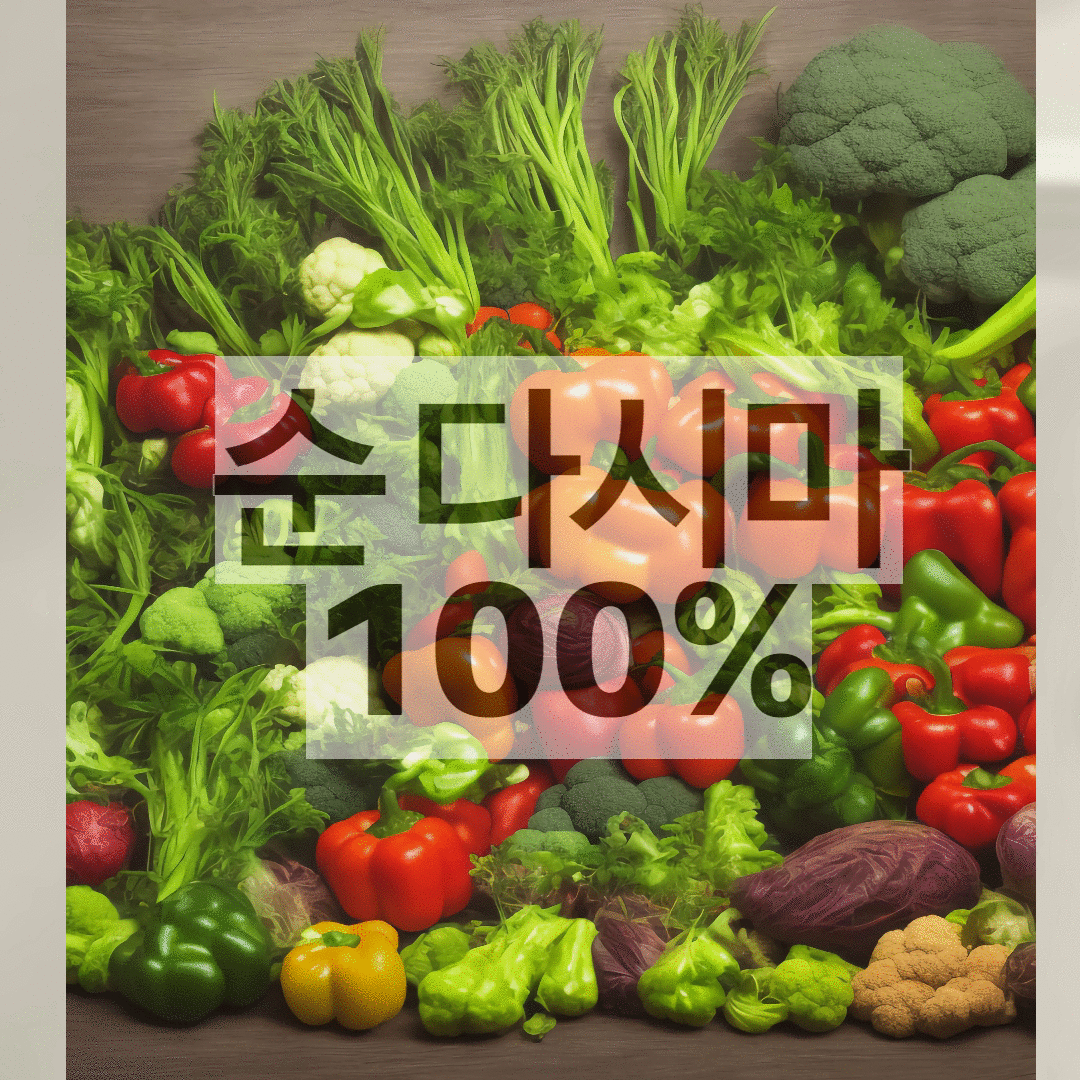자연은 그 자체로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한다. 가뭄, 해충, 타는 듯한 날씨와 이른 서리를 만나면 어떤 볍씨를 남가야 좋을지 생각한다. 정말? 그렇다. 어떤 씨앗이 성장할 때 곤돌릿 궤도(철로의 복선이 단선으로 만나는 구간)를 헤쳐 나가는 데 가장 적합한지를 계산한다. 그래서 자연은 이전 연도에 당했던 문제를 지식으로 기억하면서 씨앗 유전자에 저장해 둔다.
해마다 이런 사이클을 반복한다. 그러면 씨앗(볍씨)은 자기가 축적해 둔 자료를 처리하면서 경험으로 알고 있는 기억의 층-다시 말해 라오스가 아닌 다른 지역, 다른 계절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성분을 가진 볍씨를 만들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 새로운 볍씨를 만든다. 그러다 보면 이 볍씨는 원래의 고향으로부터 무지하게 머나먼 캘리포니아 프레스 노의 반사막 산업지대까지 왔지만, 전혀 다른 나라 볍씨가 아닌 것으로 점점 바뀌어 가서 이제
는 오히려 이곳에서 자라는 거주자처럼 된 것이다.
‘피처럼 붉은 쌀’부터 ‘할머니의 쌀’까지 ....라오스에서 가져온 볍씨로 만들어
이런 쌀을 만들고자 한 시도는 라 씨나 다른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 건 아니었다. 벽돌쌓기에 비유하자면, 그녀가 쌓은 벽돌은 그녀보다 앞선 사람들이 쌓은 모든 벽돌의 맨 위에 놓인 것이다. 그녀보다 앞선 사람들도 그들이 살던 시대에 오늘날 그녀가 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낯선 기후적 도전에 대응했고, 그들의 특별한 미의식과 가치관을 주입했다. 그리고 미세하게 변하는 유전자의 단편을 보고 그들이 어떤 길로 움직였는지를 기록했다. 이러한 시간이 쌓여가면서 모든 개인적의 기억은 집단적 역사로 합성되어 곡식 낱알에 박히게 되고-그것이 바로 그들이 만든 ‘몽족의 쌀’이었던 것이다.
똑같은 일이 아시아 전역에 걸쳐 일어났다. 볏 속(屬)과 벼의 종(種)이 길들어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거의 모든 계곡, 언덕과 평원으로 날랐다. 파키스탄으로부터 인도네시아, 일본까지 말이다. 그러한 이전 혹은 이동은 적응을 필요하게 만들었다. 그런 적응은 다양성을-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회복 탄력성을 낳았다.
어떤 장소에서 사람들은 반수생(半水生) 식물 을 구슬려, 이를테면 밀 같은 곡물을 건조한 땅에서 자라게 하였다. 다른 장소에서 그들은 벼의 줄기를 몇 미터 높이로 자라게 만들어, 홍수의 계절에도 물이 이삭까지 차오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돌연변이의 특별한 향이 나는 쌀을 만들었을 때 그들은 그 볍씨를 저장했다. 새로운 형태의 볍씨가 외부로부터 그들에게 들어왔을 때 그들은 그들이 정주해야 할 장소와 욕구를 반영하여 적응할 수 있는 쌀을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 마을에서 나는 쌀의 스펙트럼은 그런 그룹의 집단적 초상이었다.
그들은 이주할 때마다 그들만의 쌀 종자를 가지고 갔다. 그 종자는 그들이 먹어야 할 음식이었고, 어쩌면 음식보다 더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누구인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다음 화신을 위한 씨앗 역할을 하였다.
라 씨는 두 보따리의 볍씨를 작은 헛간으로 가져가서 멈추더니 보따리에 든 볍씨를 건조할 만한 장소를 찾는 듯했다. 유리처럼 평평한 바닥이라 싶은 곳에 라 씨는 보따리에 든 볍씨를 펼쳐놓는다. 이들 볍씨 가운데는 찹쌀 볍씨가 있고 찹쌀이 아닌 붉은 쌀 볍씨, 그리고 세 종류의 ‘nplei tshav’, ‘피처럼 붉은 쌀’도 있다. 이 쌀은 알갱이가 짙은 자주색을 띠어 그런 이름이 붙었다.
볍씨 보따리 안에는 라 씨가 아칸소라고 부르는 볍씨도 있었다. 그런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 볍씨를 아칸소 오르작스(Orzarks)에 있는 그녀의 고모로부터 얻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npley Mai Tia’라고 부르는 또 다른 종류는 예전에 누군가가 Mai Tia라는 이름의 여성으로부터 볍씨를 받아 그녀에게 주었기 때문이었다. 특별한 뜻이 없이 볍씨를 준 사람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다.
볍씨에는 아무 표시도 안 되어 있지만, 라 씨는 눈으로 어떤 볍씨인지 구분할 수 있다. 그녀는 각각의 볍씨가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 풍년이 든 해에 어떤 볍씨를 쓰면 생산량이 얼마가 될지도 알고 있다. 어떤 볍씨가 흉년을 견딜 수 있는지도 물론 알고 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떤 볍씨가 향을 갖고 있는가도 안다.
소비자들 역시 그들 자신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쌀을 이름으로 사려고 한다. 몇 년 전, 라 씨는 소비자들이 그들이 라오스에서 알고 있었던 시절로 돌아가 똑같은 이름으로 사겠다는 쌀이 있었는데 마침 다 팔리고 없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더 좋은 향을 가진 새로운 종류의 쌀을 소개했지만, 그들은 멈칫했다-그것은 ‘npley nian tais,’ 할머니 쌀로 불리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라 씨는 그 쌀 이름을 그녀의 상표로 바꿔서 라오스에서 온 쌀이란 뜻의
‘npley Nplog Teb’라고 불었다. 그 브랜드가 지금 가장 잘 팔리는 새로운 쌀이 되었다.
세계 최초의 쌀농사가 이루어졌던 한반도
뉴욕타임스에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쌀농사가 한반도에서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제시하겠다. 현재 오창 과학 산업단지가 있는 충북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에서 1997~1998년 지표조사를 하던 중에 고대 볍씨 59톨이 구석기 유물들과 함께 발견됐다.
그 당시 출토된 볍씨는 야생 벼가 아닌 재배 벼였다. 분석 결과는 1만 3000년~1만 5000년 전의 것으로 찍개, 긁개, 홈날, 몸돌, 격지 등의 구석기 유물도 함께 발견되었다.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세계 최초의 벼 경작지였다.
한국선사문화연구원은 “소로리 볍씨의 절대 연대가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개발한 탄소연대 측정계산법 적용 결과, 기원전 1만 5118년으로 나왔다”면서 “지금까지 학명(學名) 없이
'소로리 볍씨'로만 불렀으나 'Oryza sative coreaca(오리자 사티바 코레아카)' 곧 '한국의 고대벼' 라는 학명이 부여됐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는 이런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다. 벼농사는 6천500년 전에 많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배했으며 4천~5천 년 전, 인도 갠지스(Ganges)강 유역, 북부 미얀마, 타이, 라오스 혹은 중국 남부지역에서 시작되었다가 한반도에는 쿠로시오(黑潮)해류를 타고 온 동남아인에 의해서 전파됐다는 동남아인 이주설을 믿고 있다.
중국에서의 벼 재배는 BC 5세기 혹은 BC 11세기 전후, 중국 남쪽으로 확산했다는 남부확산경로(southern diffusion route) 설이 정설이었다. 하지만 최근 컴퓨터 알고리즘 분자 시계(molecular clock) 분석에 의하면 중국의 벼는 대략 9천 년 전, 인도 야생 벼와 비슷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기원전에 벼를 재배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고, 특히 논벼는 한반도에서 중국 쪽으로 건너간 것으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7월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에서 BC 2천100년 경으로 추정되는 탄화미(炭化米)가 나왔고, 1987년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가와리) 신석기 토층에서 나온 12톨의 볍씨도 미국 베타연구소에서 방사성탄소연도측정(radiocarbon dating) 결과 BC 2천300년경인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벼농사의 긍지를 살려서 지난 1972년부터 한국은행 50원짜리 동전에 벼 이삭을 도안해 논벼 농사의 기원지(Origin of rice farming)가 한국임을 기념했다.
쌀은 밀과 보리 등 다른 작물에 비해 생산성이 뛰어나다. 볍씨 한 톨로 700~1,000톨의 쌀을 얻을 수 있다. 15세기 유럽에서 밀을 뿌려 수확한 양은 종자 대비 3~5배에 불과했다. 현재도 밀은 기껏해야 20배 정도의 수확량밖에 얻지 못한다. 반면 벼는 17세기 무렵에 이미 종자 대비 20~30배의 수확량을 얻었고, 현재는 120~140배의 수확량을 올리고 있다.
당시 사람들은 벼가 평균 1천8배가량의 산출을 얻는다고 믿었기에 벼화(禾)를 1,008(千八 )을 의미하는 벼화(禾)로 창작했다. 볍씨를 뿌려서 벼를 추수하고 찧어 쌀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손이 88번 가량 간다는 의미에서 88(八十八 )로 쌀미(米)자를 만들었다. 다른 한편으로 벼농사는 일반적으로 88배 정도 소출을 본다고 믿었기에, 오늘날 승수 효과로 표시하면 생산 창출 효과를 (88)n으로 추산할 정도로 먹거리생산에 변혁을 초래했다.
쌀은 깊은 역사만큼이나 세계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흔적을 남겼다. 특히, '아시아는 밥, 유럽은 빵'이라는 말처럼,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에서 쌀 음식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만 해도 쌀로 만드는 음식은 밥, 떡, 떡볶이, 한과, 막걸리, 식혜 등 가공식품도 있고 콩나물밥, 무밥 등 처럼 각종 재료를 넣어 만드는 밥은 정말이지 종류가 헤아릴 수 없다.
무궁무진한 쌀밥과 쌀 요리, 가칭 『세계 쌀 밥맛 올림픽』을 개최하자
쌀 요리하면 베트남 쌀국수가 떠오르는데 쌀국수는 베트남 북부에서 프랑스 수프의 영향을 받아 생겼고 나라가 분단되면서 남쪽으로 전해진 것이다.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는 주로 알곡이 가늘고 푸석푸석한 인디카 종의 쌀을 가지고 밥을 해 기름에 볶아먹는다. 말레이시아의 '나시레막', 인도네시아의 '나시고랭'이 대표적이다.
카레라이스는 흥미로운 쌀 요리 중 하나인데 원래 인도 요리였던 커리(curry)가 인도를 식민지로 삼았던 영국의 영향을 받아 점차 변하기 시작하다가 1870년대 일본의 한 유학생이 미국행 배에서 커리를 처음 접한 후에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서양에도 대표적인 쌀 요리가 있다. 서양에서 벼농사 를 가장 먼저 시작한 이탈리아의 리소토(리조또)이다. 이름 자체가 쌀을 뜻하는 '리소riso'와 적음을 나타내는 접미사 '토tto'가 합쳐져 '짧은 시간에 만드는 쌀 요리'다.
리소토는 16세기 경 밀라노에서 만들어졌는데, 당시 쌀밥 요리인 '파에야' 태생지인 스페인의 지배 아래 있어, 리소토 탄생에 최적의 환경이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리소토는 이탈리아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쌀농사가 세계 최초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한반도가 쌀농사에 적합한 곡창지대일 뿐 아니라,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마을 공동체 형성이 그만큼 빨리 이뤄졌다는 의미이다.
보리나 밀과 달리 쌀농사는 많은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논을 만들고 물을 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쌀농사에 필수적인 모내기와 벼 수확, 배수 작업을 공동으로 하는 과정에서 두레와 마을공동체가 형성된다. 고대 한반도에서는 이렇게 씨족 공동체가 발달해 부족사회를 형성하고, 대규모 치수 사업을 통해 국가의 등장도 여타 지역에 비해 빨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을걷이가 한창인 요즘 쌀이 남아돌아 걱정이라니 쌀농사의 기원인 한반도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안타깝다. 그렇다면 전 세계인들을 세계 최초의 쌀농사 기원국인 우리나라에 불러 가칭 ‘세계 밥맛 올림픽’을 개최해 보면 어떨까? 당장 쌀이 남아 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최고의 쌀 요리가 K-food로 태어나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것만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