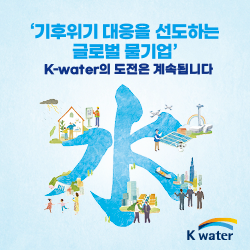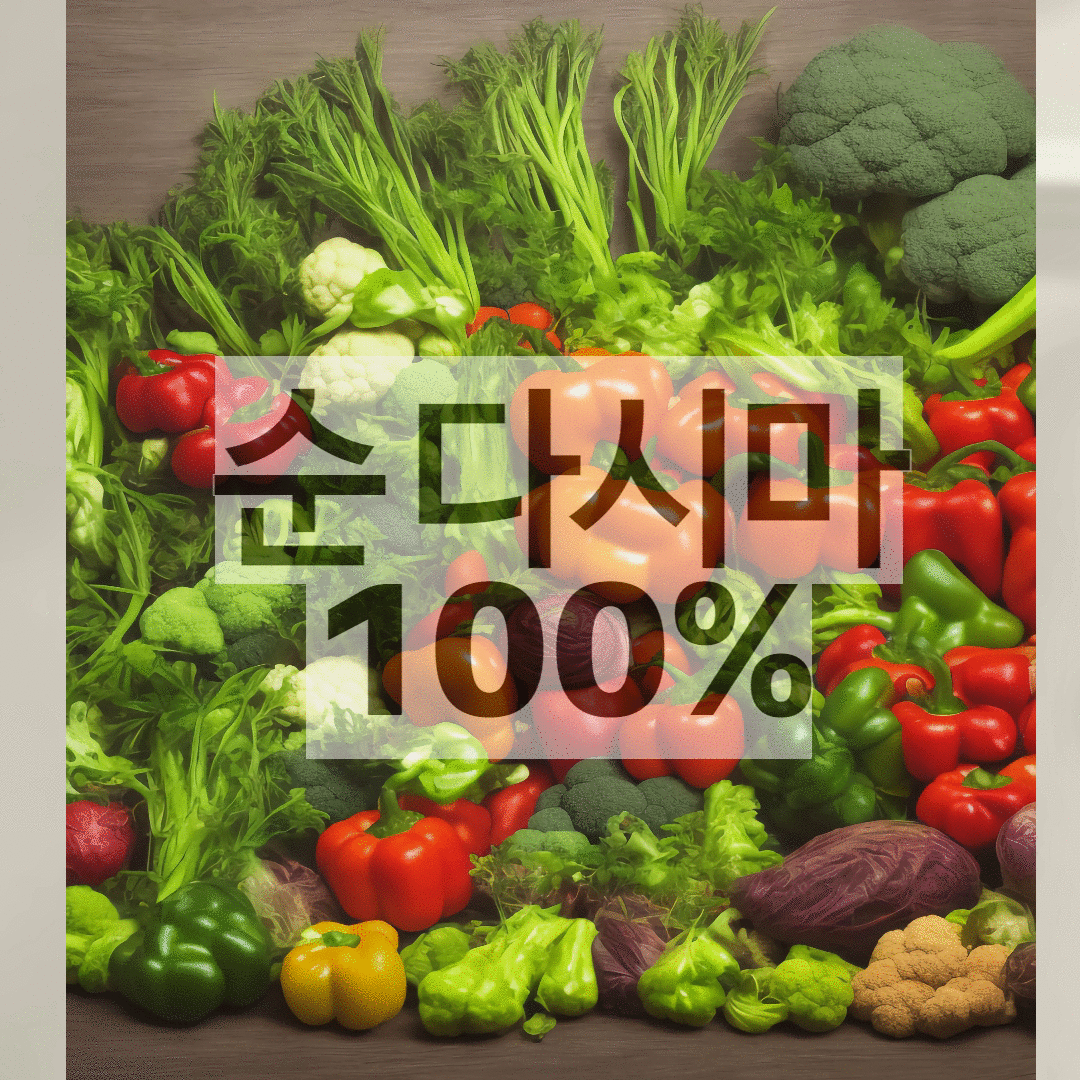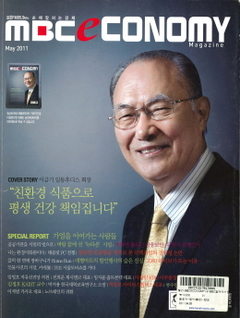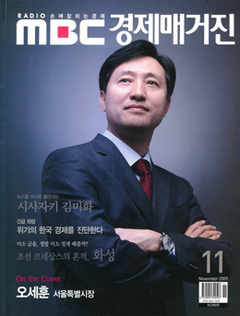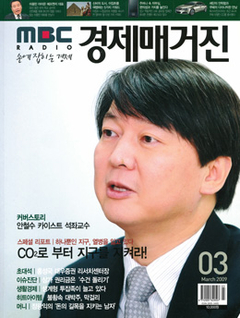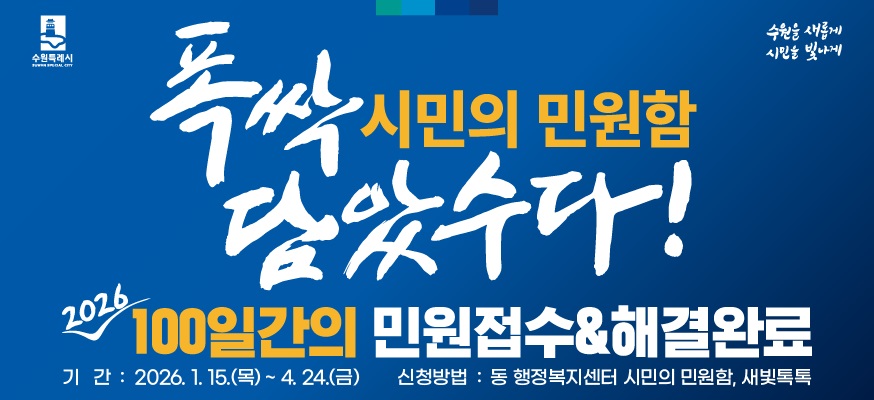중국이 인공지능(AI)을 바탕으로 로봇, 자율주행, 헬스케어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 기술 제재 강화가 한국에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7일 발표한 '미중 경쟁에 따른 중국의 AI 혁신 전략과 우리 산업의 대응'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오픈AI의 '챗GPT'에 필적하는 오픈소스 생성형 AI 모델을 선보이며 세계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중국이 단순 추격이 아닌, 선도 기술 개발도 가능함을 입증한 사례로, 미중 간 AI 경쟁의 확산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중국은 로봇, 자율주행,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자체 AI 제조 생태계를 빠르게 완성해나가고 있으며, 수년 내로 이들 분야에서 본격적인 기술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의 기계, 모빌리티, 바이오 수출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은 알고리즘과 컴퓨팅 파워 분야에서 앞서가고, 중국은 데이터와 제조 강점을 활용해 산업 적용을 확산시키는 구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기술 추격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탄탄한 제조 기반과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AI 혁신을 가속할 수 있는 조건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지난 2월 2027년까지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3조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중국은행이 AI 산업에 1조 위안(약 200조 원) 지원을 약속한 것과 비교할 때 투자 규모와 속도 면에서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의 기술 협력뿐 아니라, 자국 제조 역량과 인재를 기반으로 미국 시장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산 드론, 로봇,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 표준을 충족하는 고품질 제품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경쟁력을 지녔기 때문에, 이 틈새를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은교 산업연구원 중국연구팀장은 "고대역폭 메모리(HBM) 반도체, 로봇, 바이오 제조, 의료 산업에 AI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겨냥한 선제적 수출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