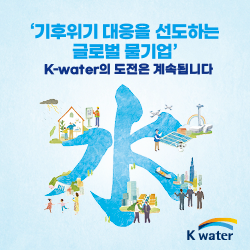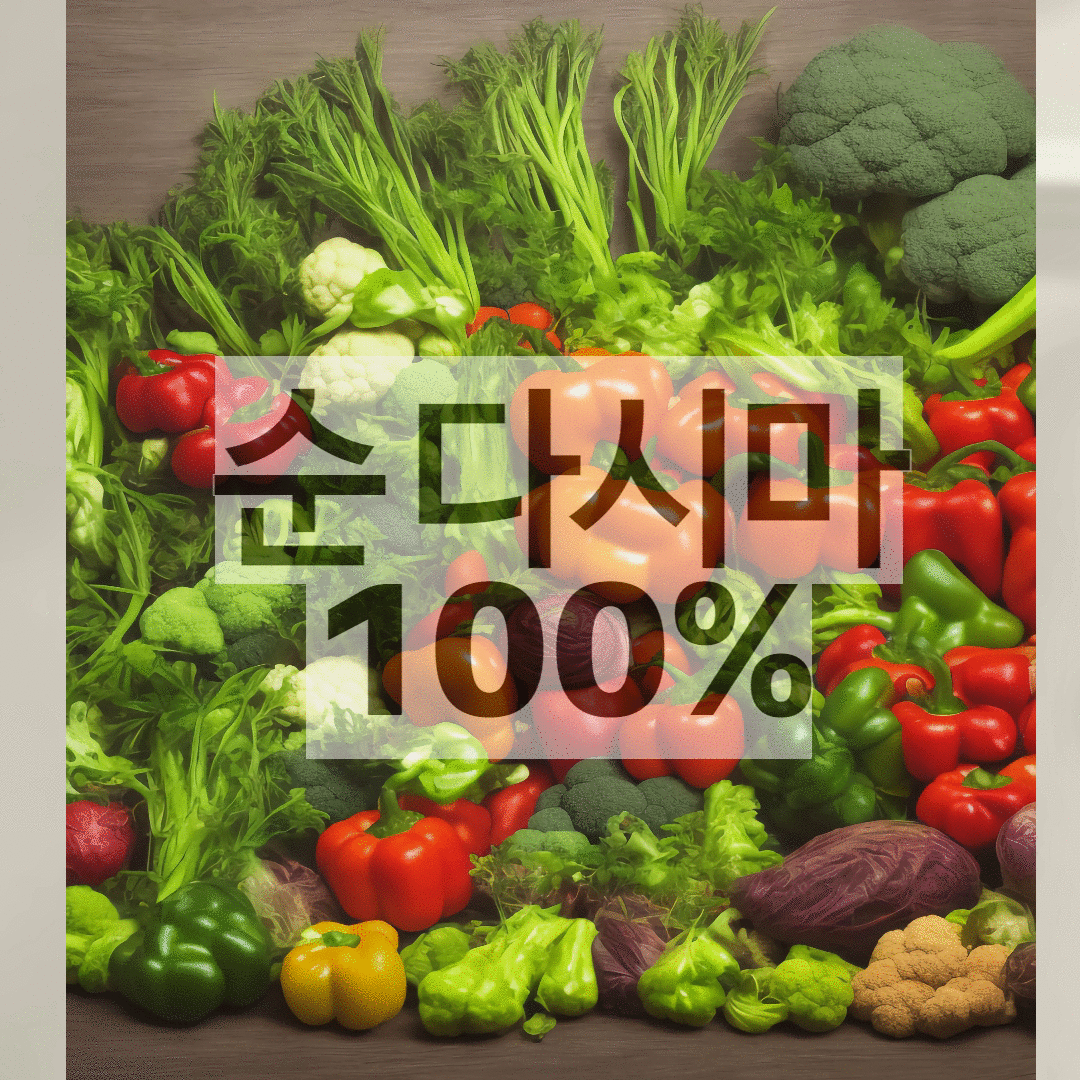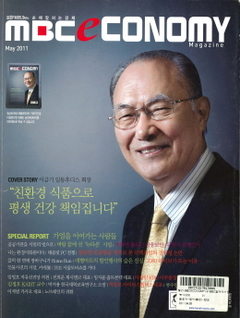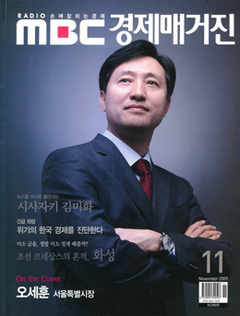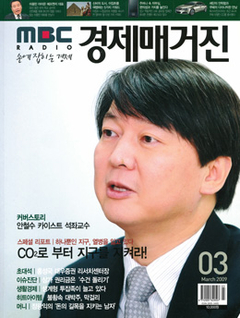이재명 대통령이 풍력 발전을 에너지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대대적인 확대 계획을 밝히면서, 정부는 해상에서 대규모 전력 생산이 가능한 해상풍력 설비를 지난해 기준 2.19GW에서 2030년 17.3GW, 2040년 40.6GW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내년 3월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을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해상풍력 산업을 어떻게 국내에 연착륙시킬지가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얼마나 세밀하게 이해관계자 갈등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대규모 확충 계획의 성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주민 수용성이다. 특히 조업 훼손에 대한 어민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해상풍력 설비를 설치할지에 대해 업계와 어민 사이 사전 협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 입지 선정, 해저 케이블 매설 경로, 시공·운영 과정에서의 어장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둘러싸고 체계적인 소통 구조를 만드는 일이 필수적이다.
섬나라이자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추진 중인 일본도 비슷한 갈등을 겪었다. 일본 정부는 자국 해역에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면서 어민들의 반발에 직면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장치를 마련해왔다. 현재 일본은 2030년까지 해상풍력 10GW, 2040년까지 30~45GW 설치를 목표로 삼고 있다. 수산업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유지하기 위한 ‘공존의 룰’을 제도화해 나가고 있는 셈이다.
하세 시게토 일본 수산청 전 장관은 지난 20일 ‘지속가능한 어촌을 위한 해상풍력과의 공존’을 주제로 열린 해상풍력 일본 전문가 초청 행사에서 일본의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어민에게 피해를 주는 무분별한 해상풍력 난개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정책 기조가 단순한 ‘어업 보상’에서 ‘어업 협조’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해상풍력을 ‘피해를 보상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역 어촌과 상생하는 파트너’로 인식하게 만드는 전환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다.
하세 전 장관은 또 “사업 초기부터 중요한 정보를 어민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정부가 지자체, 어업 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풍력 사업 협의회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민들이 뒤늦게 결과만 통보받는 구조가 아니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사례는 국내 해상풍력 업계에도 분명한 시사점을 던진다. 해상풍력 단지 조성 여부가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사업 속도만 앞세워 추진하다가는 “조업권 침해” “어장 생태 파괴”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당한 절차와 충분한 정보 공개, 어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협조 체계라는 ‘룰’이 먼저 서야 산업도 지속 가능하다.
정부가 해상풍력 산업의 조기 정착을 서두르기에 앞서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주민·어민 참여 절차를 제도에 명시하고, 사업자에게는 어민과의 사전 협의 및 갈등 조정 책임을 분명히 지우는 것이다. 단순 일회성 보상금 지급을 넘어 장기적인 이익 공유, 공동 모니터링, 어장 환경 개선과 연계된 사업 모델까지 포괄하는 ‘상생 패키지’를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해상풍력은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이 크지만, 갈등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된다. 일본이 시행착오 끝에 ‘어업 보상’에서 ‘어업 협조’로 방향을 튼 것처럼, 우리 정부도 어민들과의 신뢰 회복과 정교한 제도 설계를 통해 해상풍력의 토대를 다져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