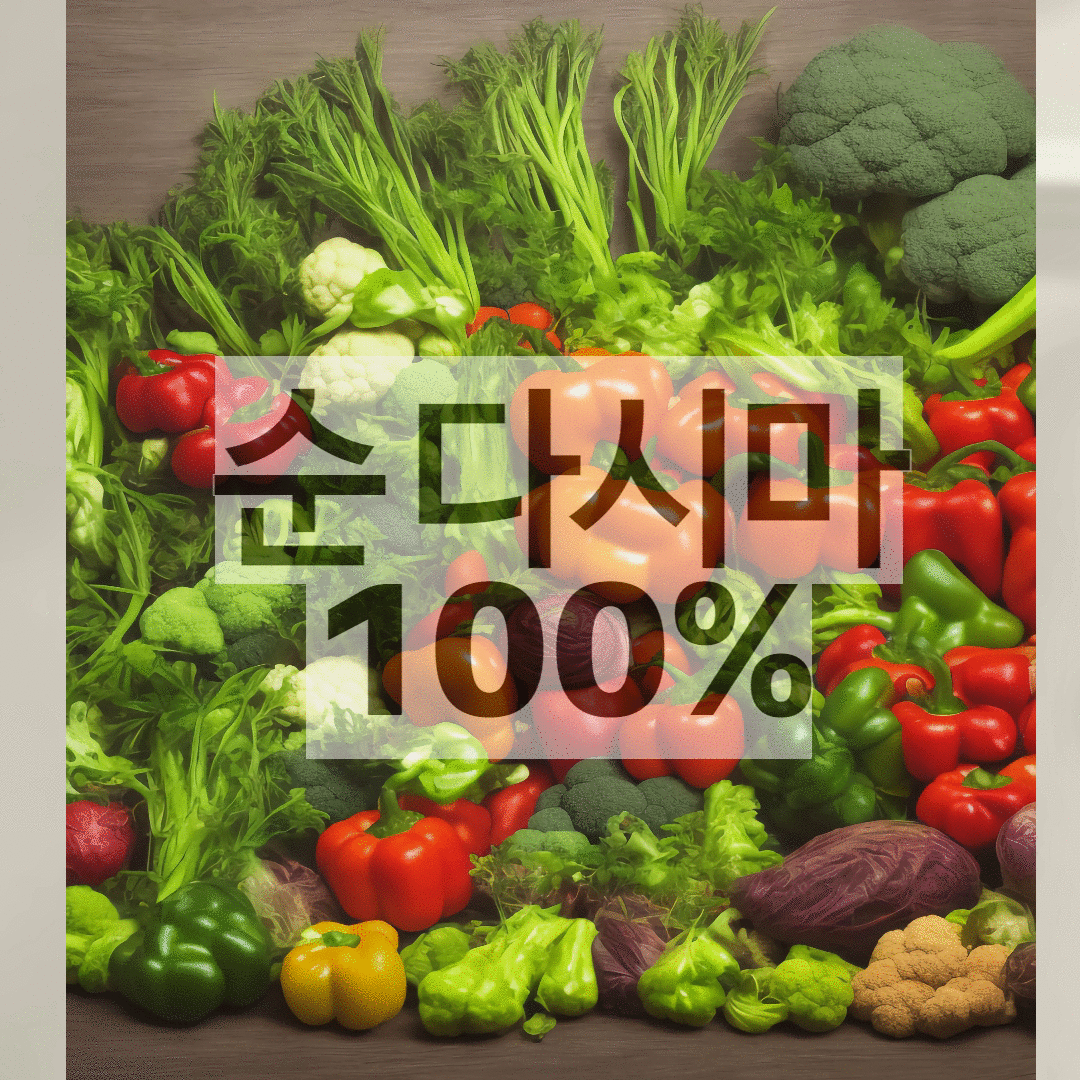20년 전의 청소년들이 이제는 부모가 되었다. 당시를 떠올리면, 10대 시절 부모와 시간을 보내는 일은 대개 피하고 싶은 일이었다. 간섭처럼 느껴졌고, 잔소리로 들렸으며, 무엇보다 ‘나만의 세계’를 침범당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소아과 의사들과 공중보건 연구자들의 최근 연구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놓는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가족 간의 유대가 성인이 된 이후 더 나은 삶의 질적 수준과 정신적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주 「JAMA Pediatrics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시절에 부모와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인이 되었을 때 높은 사회적 유대감을 가질 확률이 23.4%포인트 더 높았다.
특히 성인의 사회적 행복의 측정에 사용한 '6가지의 모든 지표-예를 들어 소득, 건강, 심리 검사, 삶의 만족도 등) 에서 일관되게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연구 결과가 새삼 주목받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소셜 미디어로 언제든 연결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면 접촉이 급격히 줄어든 사회다. 가족끼리 밥을 함께 먹는 시간은 줄었고, 대화는 메시지와 이모지로 대체됐다. 밥 먹으라고 하는 말도 메시지로 보낸다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미국에서는 2023년 공중보건국장이 공식적으로 ‘외로움 전염병’을 선언했다.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불안 장애, 심혈관 질환, 우울증, 조기 사망 위험까지 높이는 중대한 건강 위험 요인이라는 판단에서다.
외로움은 이제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낸 구조적 현상이다.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줄고, 세대 간 교류가 단절되며, 공동체는 파편화됐다. 아이들은 부모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화면 속에 머문다. 말은 줄고, 표정은 읽히지 않는다. 그 공백 속에서 외로움은 조용히 자라난다.
외로움 전염병이라는 말은 과장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미 많은 사회가 그 증상을 겪고 있다. 고립된 노인, 불안에 시달리는 청소년, 관계 맺기에 서툰 부모 세대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거창한 정책이나 첨단 기술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장 오래된 방식,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에서 출발할 수 있다.
필자 개인적으로 아버지와 중등학교 아들이 함께 길을 걷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경험이 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150여 쌍의 부자(父子)들이 말없이 산길을 걷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하산 후 공연이 시작되자 같이 춤까지 추는 거였다.
마주 앉아 대화할 때보다, 나란히 걷는 상황에서 말문이 트이고 시선이 부딪히지 않아 부담이 덜하고, 침묵조차 어색하지 않기 때문이다. 걷는 속도만 맞추면 된다. 그 단순한 조건이 관계의 문을 연 것이었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이런 경험의 가치는 더 커질 것이다. AI는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을 돕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함께 걷는 경험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손의 온기, 호흡의 리듬, 같은 풍경을 공유하는 기억은 알고리즘이 흉내 낼 수 없는 영역이다. 기술이 인간의 일을 대신할수록,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관계의 노동은 더욱 중요해진다.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뒷산에 올랐던 기억이 선명하다. 어린 내 손을 잡고 아버지는 풀과 꽃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이름을 알려 주셨다. 그날 나는 할미꽃 한 송이를 꺾어 들고 내려왔는데 그 장면은 나이가 들수록 더 또렷해진다. 삶이 고단해질 때마다 그 기억은 조용한 위로가 되고 자연과 친구가 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다. 함께 걷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침묵하던 그 짧은 시간이 결국 나를 지탱하는 뿌리가 되었음을 이제야 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빠르게 재편하는 시대일수록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최신 기기가 아니라 그런 한 장의 기억, 부모와 함께 걸었던 시간의 온기일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