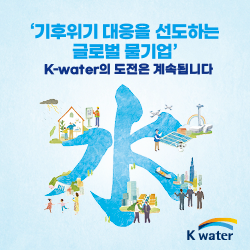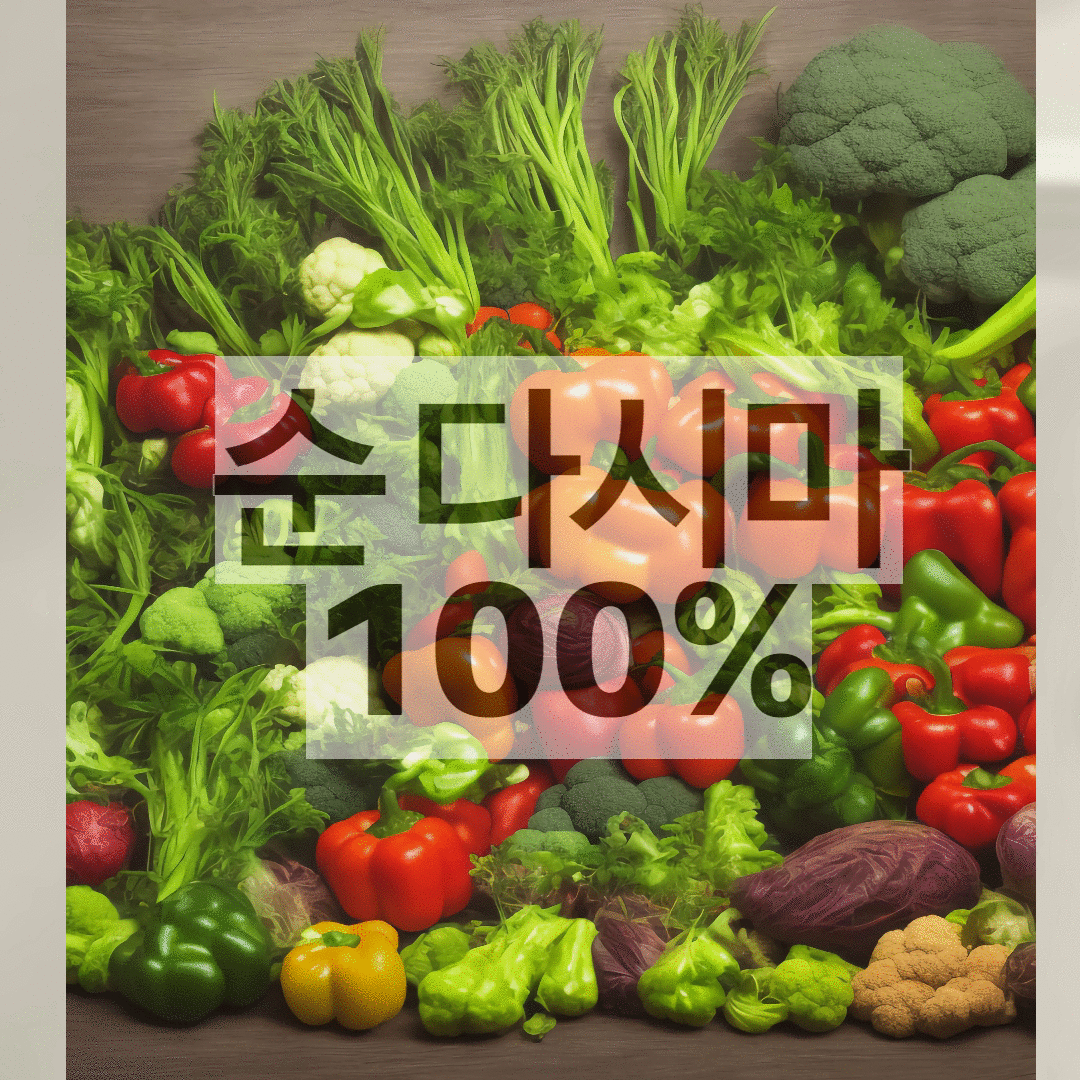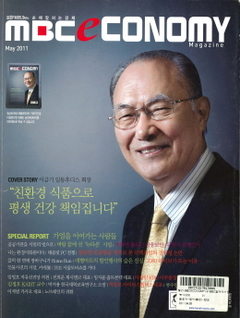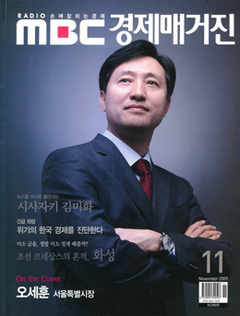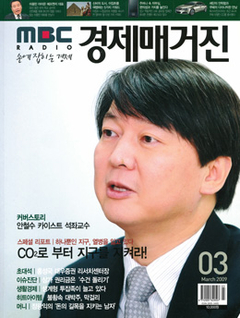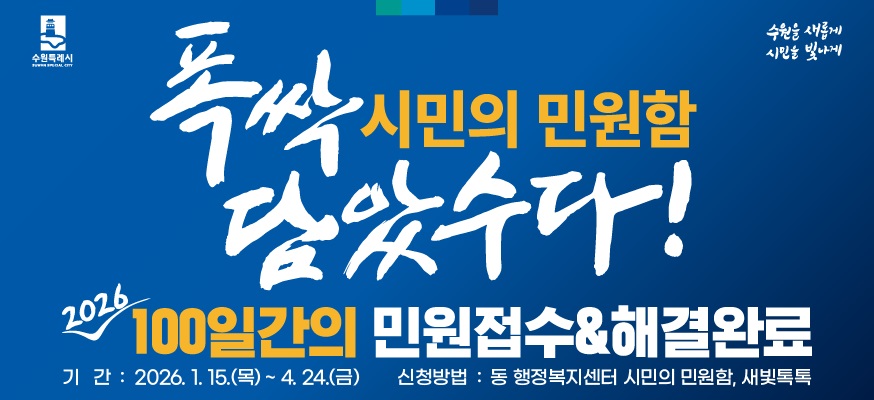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270만호 주택공급을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웠다. 집권 이후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위해 각종 금융지원, 세제혜택, 매입임대 확대 등은 노골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 기준, 5.6억원에서 –0.4억원(-8%) 하락해 5.2억원이 됐다. 경기도는 6.2억원에서 –0.7억원(-11%)이 하락한 5.5억원, 인천은 4.7억원에서 0.6억원(-12%)으로 4.1억원, 5대 광역시는 4.1억원에서 –0.5억원(-13%)이 하락한 3.6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전국 매매가 하락이 –8%에 그친 것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영향으로 추측된다.
경실련은 자체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울 25개구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 변동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임기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시세는 총 –0.2억원(-2%) 떨어졌다. 경기도·인천·5대 광역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 이상 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적게 떨어진 원인은 서울 똘똘한 한 채를 사들이려는 수요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2023년 집값이 하락을 멈추고 보합 상태에 머문 것은 서울 집값이 낮아진데다, 정부가 규제 완화 및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하자 집을 사들이려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시세가 지난해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원인 중 하나는 매입임대주택이다. 정부가 공공주택을 확대하면서 다세대 주택을 비싼 가격에 마구 사들이면 가격이 상승했고, 2025년 1월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것이 결정타가 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폐지 한 달 만에 확대 재도입 됐지만 여론은 급속히 악화돼 오세훈 시장은 21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 변동을 보면, 강남 3구 아파트 시세는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4.7억(1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강남 3구를 제외한 비강남 22개구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는 윤석열 정부 임기 초보다 –0.9억원(-7%)이 떨어졌다.
특히 강남 3구와 비강남 22개구의 아파트 시세 격차가 거의 3배 수준으로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 임기 초인 2022년 5월 아파트 시세 차이는 14.6억원(2.3배)이었는데, 12월까지 12.9억원(2.2배)으로 좁혀졌다. 2023년 14.4억(2.4배)으로 격차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하여 2024년 17.9억(2.7배), 2025년 4월 20.1억(2.9배)으로 확대됐다.
강남-비강남의 격차 확대는 ‘똘똘한 한 채’ 수요의 궁극적 목표가 강남 아파트였음을 보여준다. 전국의 집값이 하락해도 강남 집값만큼은 이내 하락을 멈추고 이전보다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강남-비강남 자산격차가 확대된 것 이상으로 서울-지방, 강남–지방 간의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평균임금을 받는 노동자(통계청 기준, 임금 상승률인 3.15% 적용)를 적용가 숨만 쉬고 임금을 모은다는 가정하에 강남 30평형 아파트 매입까지 소요 기간은 2022년 5월에는 69년이었지만 2025년 4월에는 74년이 걸려야만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됐다. 3년 만에 무려 5년이 더 늘어났다.
경실련은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서울의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부담금 완화 등도 고려 중이라 알려진다. 공급 확대 시 벌어질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인지 크게 우려된다”며. “한동훈·김문수·홍준표·안철수 후보 등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공급확대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앞세우고 있어 우려되기는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선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의 집값 부양정책(매입임대, 재건축 활성화 등) 전면 재검토 하고, 부동산 부양 정책 공약 즉각 폐기해야 한다. 후분양제, 개발이익 50%이상 공공 환수, 공기업 공공택지 매각 중지, 장기공공주택 공급 등 대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