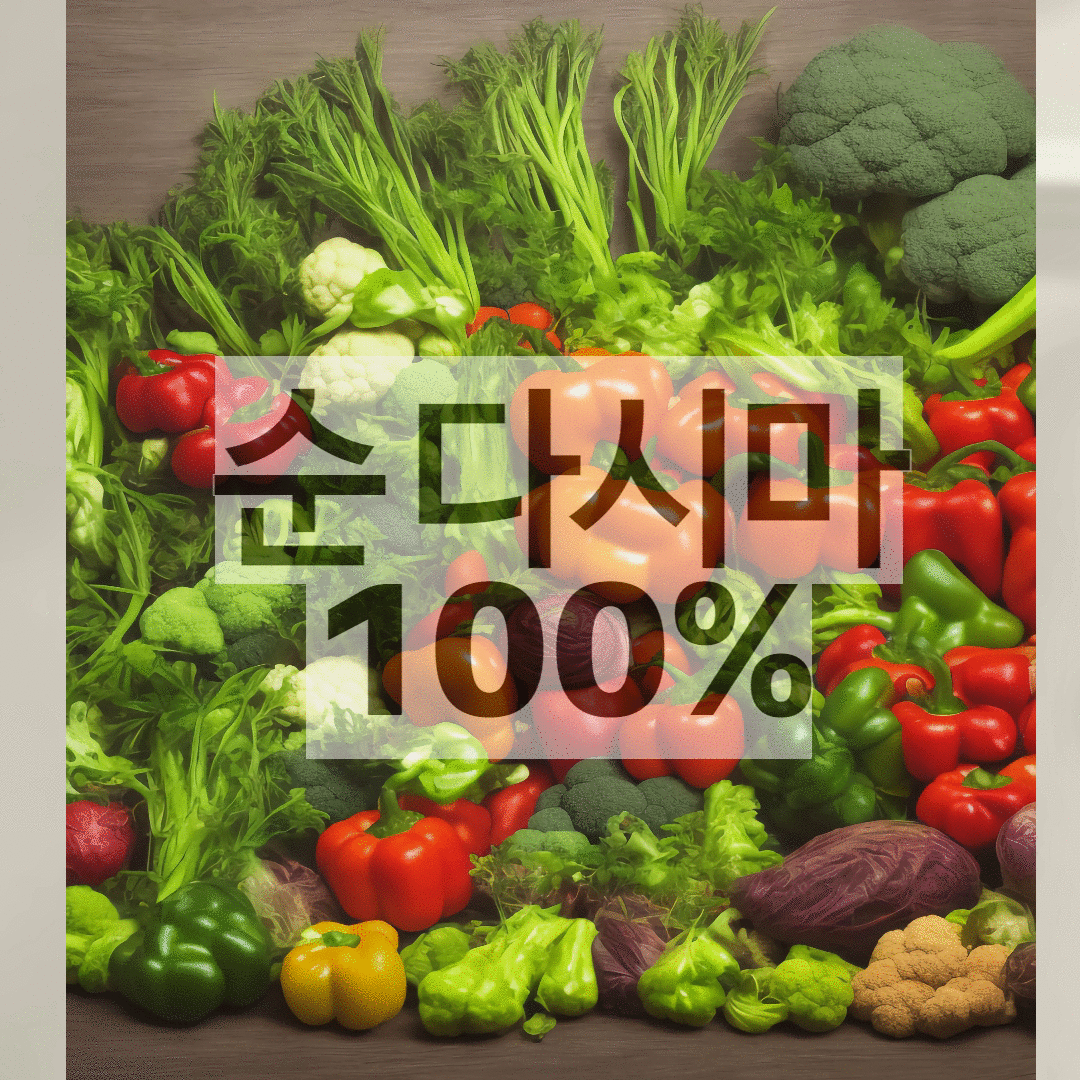서점, 특히 독립 서점에 들어서면 묘한 느낌이 든다. 매일 정치 뉴스에 휘둘리는 일상과 달리 이곳은 정치로부터 잠시 비켜난 탈정치적 공간인 듯 해서 말이다. 더욱 눈에 띄는 변화는 정치 서적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서점 진열대는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하는 정치적 책들이 독자의 흥미를 끌었다. 이를테면 카스 머드의 『포퓰리즘』, 야사 뭉크의 『민주주의 어떻게 무너지는가』 마크 리라의 『The Once and Future Liberal』 등이 나왔고 국내 저자들 역시 권력과 대중의 위험한 결합을 분석하는 저술을 냈다.
그러나 지금 베스트셀러 진열대나 정치 서적 구역에 가보면 그때 상황과 사뭇 다르다. 새로운 정치 서적은 거의 없고 한 때 반짝했거나 혹은 교과서로 쓰임 직한 저작들이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꽂혔다. 정치 서적이 자취를 감춘 자리를 메운 것은 문학과 에세이, 그리고 자기 성찰을 다루는 책들이다.
이번 주(8월 20일~26일) 교보문고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를 봐도 그렇다. 1.가공범(히가시노 게이고 소설) 2. 혼모노(성해나 소설집) 3. 다크 심리학(다크사이드 프로젝트) 4.자몽살구클럽(싱어송 라이터 한로로의 단편소설집) 5. 키메라의 땅-1(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6. 모순(양귀자의 소설) 7. 박금희 연금 부자 수업 8. 편안함의 습격(마이클 이스터의 엣세이) 9.류수영의 평생레시피 10.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고명환 저) 순이다.
예스24의 최근 베스트셀러 순위를 봐도 상위권 대부분은 소설과 산문집. 마음을 돌보는 글쓰기로 채워져 있다.
뉴욕타임스의 오피니언 칼럼리스트인 로스 두엣이 기고한 글(8월 26일 자)에 따르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파 정치에 관한 책이 줄어들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서점을 가득 메웠던 트럼프 중심의 베스트셀러 열풍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진보 성향 독자들의 핵심 관심사가 선거의 갈등보다는 생태 문제, 포퓰리즘의 투쟁보다는 보존과 멸종에 관심을 쏟는 탈정치적 경향이라고 전했다. 실제 올여름 가장 주목할 만한 기후변화 관련 서적은 정책 서적이 아니라 소설이라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살럿 매코너기의 『Wild Dark Shore』는 해수면 상승에 직면한 남극 근처 섬을 배경으로 쓴 소설로 한 과학자와 그의 가족이 씨앗 금고를 지키려 애쓴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정책이 아니라 소설로 읽는 것일까? 원래 기후 위기 같은 주제는 정책, 제도, 법, 사회운동으로 이어져야 현실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요즘은 실천적 논의보다 소설, 에세이, 영화 같은 이야기 속에서만 위기가 소비되는 현실이 두드러진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탄소배출 규제, 정책 개혁, 국제 협약 같은 책이 서점에 많았다면 지금은 멸종 위기 동물이 등장하는 소설, 미래 세대를 주인공으로 한 디스토피아 이야기 같은 작품이 많이 나오고 더 잘 팔리고 있다.
이처럼 과학과 정치의 언어 대신 문학적 이야기와 상징을 통해 위기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사회가 정치적 해법을 기대하거나 신뢰하지 않는다, 는 반증이다. 우리나라나 미국의 그런 서점 풍경을 보면 사람들이 정치에 뭔가를 기대하기보다 되레 피로감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책을 읽어도 이제는 권력 구조의 분석보다는 개인적 생존과 내적 위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민주주의가 화두였던 자리에 ‘위로’와 ‘회복’이 들어섰음은 곧, 정치가 국민의 불안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은 정치가 ‘도덕적 흐름의 수호자’가 아니라 ‘통제하고 정복하는 권력’으로만 보일 때 정치로부터 멀어진다. 문학적 위안처럼 정치적 위안을 담은 베스트셀러가 진열대에 오르는 날, 우리는 불신과 냉소를 넘어 미래의 희망을 향해 도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