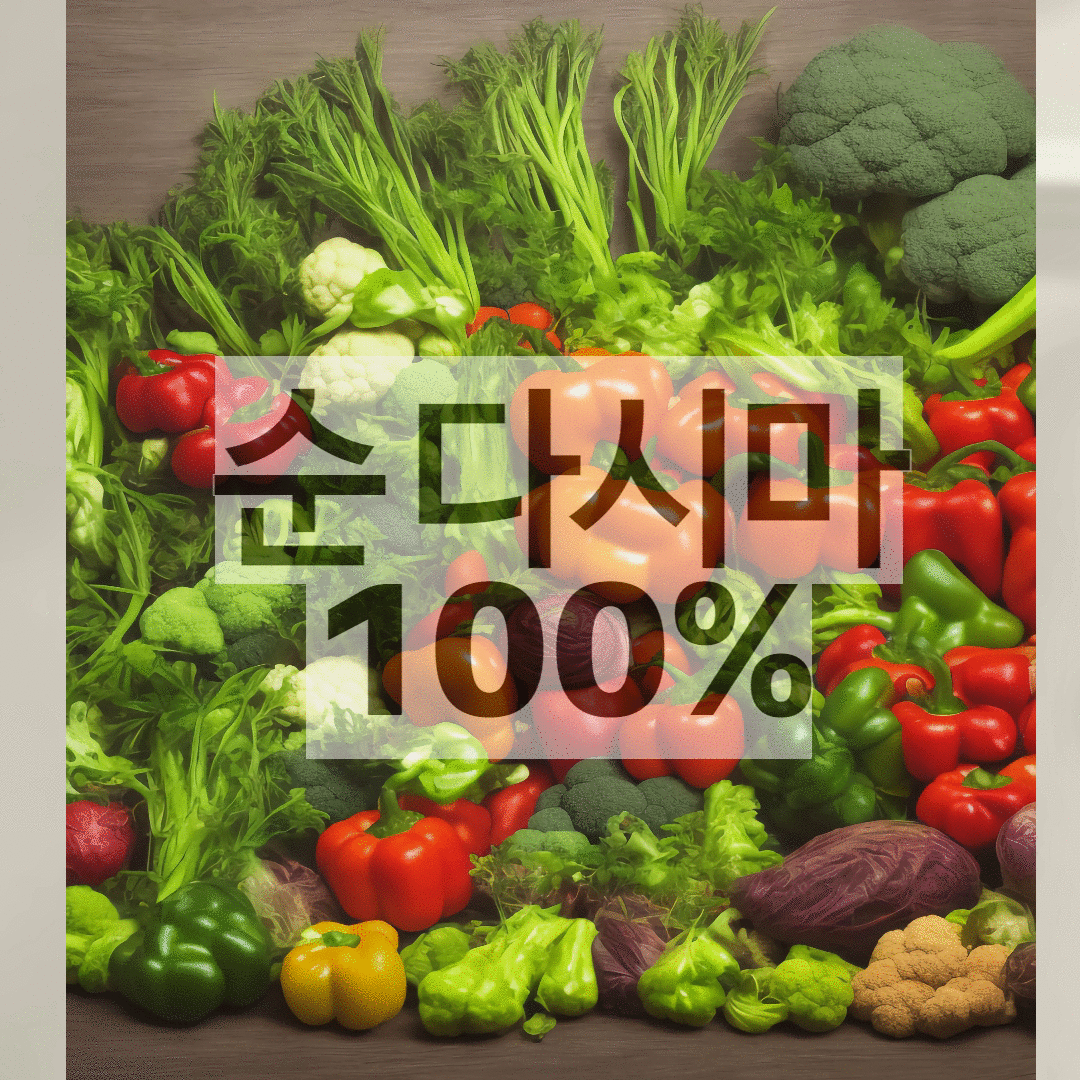최근 뉴욕타임스에서 미국의 토양 과학자 「페드로 A. 산체스」 박사가 85세로 서거했다는 부고 기사를 읽었다.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척박한 땅심을 살려 식량 증산에 이바지한 그는, 아프리카 농민들에게 옥수수와 같은 작물을 수확한 후 '세스바니아(Sesbania)'나 '테프로시아(Tephrosia)' 같은 콩과 식물 나무들을 심어 1~2년간 나무들이 뿌리에 질소를 포집해 식물이 먹을 수 있는 형태인 암모늄 등으로 바꾸어 가득 저장하게 하고, 떨어진 잎이 천연 퇴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했다.
그런 뒤 나무를 베어내 잎과 잔가지를 흙에 묻고 그 자리에 다시 작물을 심게 했다. 그 결과 비료를 전혀 주지 않았어도 토양의 질소 함량이 비약적으로 높아져 옥수수 수확량이 2~4배로 증가했다. 비료를 쓰지 않는 이 농법은 '녹색 혁명'의 아프리카 버전으로 평가받아 농업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세계식량상(World Food Prize)'이 그에게 주어지기도 했다.
고 산체스 박사가 꿈꿨던 토양은 미생물이 살아 숨 쉬고 탄소를 머금으며 스스로 생명을 길러내는 '살아있는 유기체'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곁에는 비닐하우스라는 거대한 플라스틱 돔 안에서 화학비료와 농약이라는 링거액에 의지해 연명하는 '죽은 흙'뿐이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맛의 실종 시대'를 살고 있다. 사계절 내내 마트 매대에 오르는 매끈한 채소와 과일들은 겉모양은 완벽하지만, 식물 고유의 맛과 향은 사라졌다.
예전 우리 조상들이 퇴비를 만들어 주고, 빗물로 키워낸 작물들이 가졌던 그 깊고 진한 풍미는 이제 전설 속의 이야기가 되었다. 자연의 풍파를 견디며 흙 속 미생물과 치열하게 교감하며 자란 작물에는 현대 과학이 담아내지 못하는 미량 영양소와 생명력이 깃들어 있었다.
반면, 비닐하우스 안에서 속성 재배된 채소들은 모양과 형태는 갖추고 있을지언정 우리 몸이 진정으로 갈구하는 '생명 에너지'를 주지 못한다.
이러한 비극은 토양을 단순한 '배양 접시'로 다뤄온 현대 관행농업의 오만에서 비롯되었다. 화학비료는 식물을 빠르게 키우지만, 병충해에 취약하게 만들어 농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농약과 함께 흙 속의 미생물 생태계를 무너뜨린다. 미생물이 사라진 흙은 굳고 산성화된다는 건 상식이다.
다행히 세계식량상의 흐름은 비로소 '생태적 복원'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
지난해 수상자였던 마리안젤라 웅그리아(Mariangela Hungria) 박사는 수만 번의 실험을 통해 브라질의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도 죽지 않고, 질소 고정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특정 균주(Strain)를 찾아내 개량했다.
이를 아조스피릴룸(Azospirillum)이라는 다른 미생물을 섞어 뿌리혹박테리아에 넣었는데 전체 질소 고정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화학비료를 단 1%도 쓰지 않고도 오히려 화학비료를 쓴 밭보다 콩 수확량이 많다는 것을 대규모 농장에서 입증했다.
이는 고 산체스 교수가 강조했던 토양 관리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것이자, 죽어가는 흙에 인공호흡기를 떼고 스스로 숨 쉬게 하려는 위대한 시도가 아닐 수 없었다.
이제 우리는 음식의 가치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당도와 매끈한 외형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그 작물이 자라난 '흙의 건강'을 먼저 물어야 한다.
죽은 흙에서 비료로 뻥튀기된 작물은 우리 몸 안에서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 반면, 건강한 토양에서 미생물과 함께 자란 '진짜 음식'은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를 흡수하는 해결사가 되고, 인간의 면역력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된다.
산체스 교수는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남긴 숙제는 명확하다. 비닐하우스의 가짜 풍요에서 벗어나, 빗물과 퇴비, 그리고 미생물이 어우러지는 진짜 흙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의 식탁 위에 '진짜 생명'을 올리기 위해, 발밑의 흙부터 다시 살려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