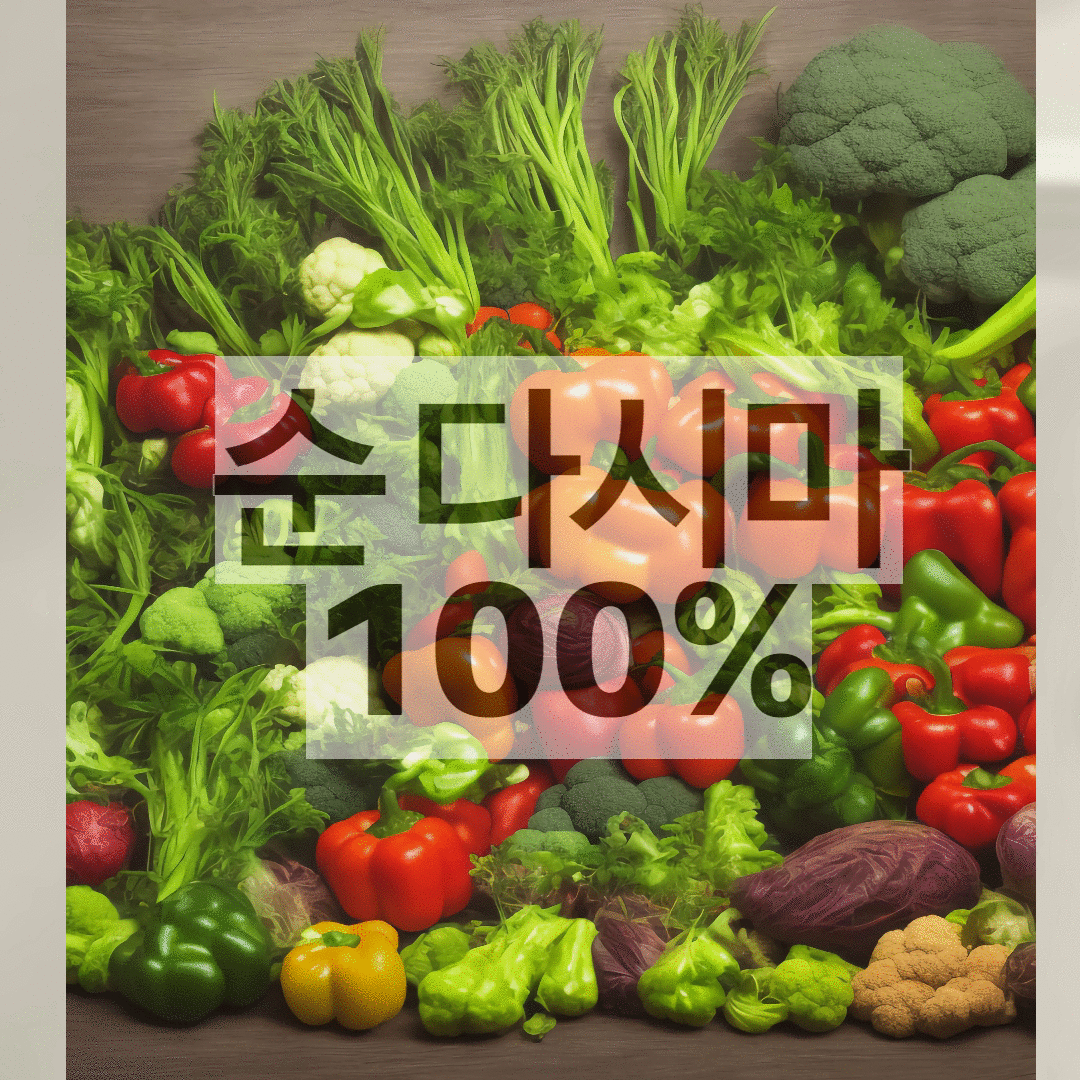내 생애에 올해처럼 극단적으로 잔인한 여름은 없었다. 밖으로 나와 조금만 걸어도 등에서 허리로 땀방울이 주르르 구르는 게 느껴지고 양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다. 거리의 은행나무나 플라타너스의 잎은 몸의 열을 발산하는 개의 혀처럼 아래로 늘어뜨렸고, 하늘에선 숯가마를 태우듯 뜨거운 열을 푹푹 뿜어 댔다.
거리의 수많은 자동차 역시 밖에서 느낄 수 없는 에어컨을 팡팡하게 틀어대며 내 주 변의 대기 온도 상승에 떼거리로 가세했다. “왜 이러는 거지? 이러다 지구에 불이 나겠어. 젠장! 자가용이 없는 넷 제로를 제대로 실천하는 나야말로 탄소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사람인데... 가진 게 없는 내가 왜 그 죄값을 받아야 하는 거지?” 나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세상을 펄펄 끓게 만드는 데 원인을 제공한 거의 모든 대상을 향해 마음속으로 원망하고 있었다.
지난 7월 초까지만 해도 불만은 나오지 않았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면서 맞바람을 쐬면 시원하기도 했거니와 몸에서 나오는 땀은 화장실에 들어가(건물 안에 샤워장이 없었으므로)물수건으로 닦고 준비한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면 되었다. 그런데 7월 말부터 더워도 워낙 덥다 보니 자전거 출근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역이 되었다.
“으음~ 올여름은 자제 하는 게 좋겠어”라고 결심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어가고 있다. 그래도 전동차를 타면 계곡에 들어온 듯 밖에서 땀으로 젖은 몸과 옷을 시원하게 말려주는 에어컨이 팡팡하게 돌아간다. 더위가 가시면 늘 가방에 넣고 다니는 책을 꺼내 읽는다. 이동 공간은 집중이 잘 되게 하는 뭐 그런 게 있잖은가. 스마트폰을 보느라 거북이 목을 하고 있는 승객들이 거의 태반이고 책을 보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도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책이나 실컷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기야 수년 전에 사두었던 붉은 벽돌 2장 두께의 돈키호테 상하권을 아직까지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초반부까지 읽다가 중단했으니까 말이다.
◇생애 처음 에어컨을 가동해야 했던 어머니의 방
돌이켜 보면 내가 보낸 젊은 시절의 여름은 괜찮았던 듯했다.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거나, 바닷가에서 사랑을 속삭이지도 못했지만 그런 류의 음악을 실컷 들을 수 있었고, 한여름을 이용해 설악산이나 지리산 종주 등반에도 전했다. 하산 길에 땀으로 범벅인 등산복을 입은 채로 차가운 계곡물에 뛰어들었을 때의 쾌감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잘 있거라, 설악아, 내 다시 오마...”라고 흥얼대던 노래가사가 새롭고, 어린 시절 보리밥에 앉았던 파리를 손으로 쫓고 밭에서 따온 오이와 장독 고추장으로 비벼 먹던 맛이 잊힐 리 없었다.
꿈같은 지난 여름밤의 추억도 잠시 지하철역 밖으로 나오면 다시 사우나탕에 들어온 것처럼 푹푹 찐다. 일몰 이후엔 선선할 법도 한데 콘크리트 건물이나 보도블록의 복사 열로 열대 정글 속에 들어온 것 같다.
“어머니, 제가 콩 국물을 사 갈 테니, 오늘 저녁 콩국수를 해 먹읍시다” “그게 먹고 싶으냐? 그럼 사 와라.” 나는 버스 정류장에 있는 홈플러스에 들어가 맑은물연천 콩국물(4,990원)과 다다기 오이(3개, 3,490원)를 사서 마을버스를 타고 어머니 집으로 간다. 지난해까지도 어머니는 손자가 안방에 달아준 벽걸이형 에어컨을 한 번도 틀지 않았다. 14층 높이의 아파트라 창문을 열어 놓으면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고, 에어컨 바람은 건강에 안 좋을 것 같다느니, 덥다 싶으면 선풍기를 틀면 된다면서 에어컨 사용을 완강히 거부했던 것이다.
그런데 올여름, 어머니는 유난히 기력이 떨어지고 있었다. 아들 형제나 조카들은 그게 다 더위를 먹어서 그런 것이 니 에어컨을 틀어야 한다고 성화였다. 예년과 달리 밤낮으로 안방이며 거실로 파고드는 뜨거운 열기가 예사롭지 않음을 감지하고 당황했던 어머니는 후손들의 성화에 못 이긴 척 생애 처음 전기세 먹는 하마를 가동시키고야 말았다.

문제는 나였다. 안방의 에어컨 바람은 거실이나 내 방까지 도달하지 않았다. 내 방에서 자다가 온몸이 진땀으로 끈적거려 잠을 못 이루고 부대꼈던 나는 결국 에어컨이 있는 안방으로 잠자리를 옮겨 어머니 침대 옆 방바닥에 요를 깔고 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