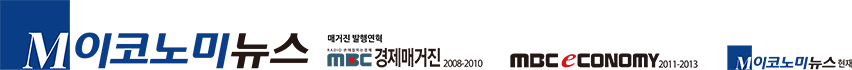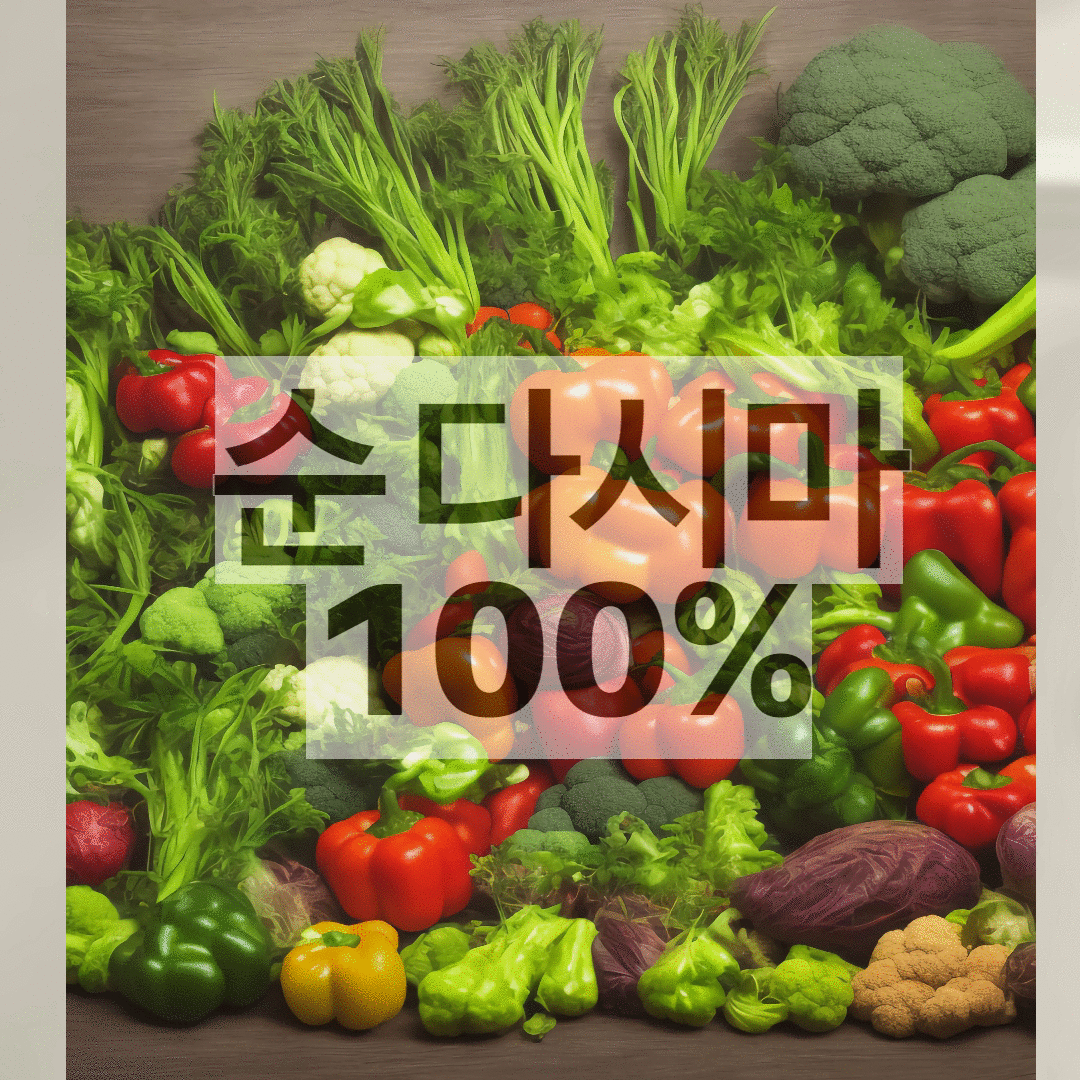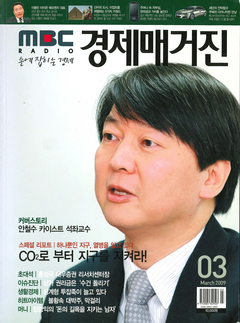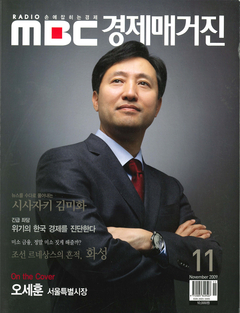◇한국 과학기술의 초석을 놓은 두 거인: 최형섭과 김재관
최형섭은 한국인 최초로 금속공학 분야에서 미국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네소타 대학 교수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을 만큼 열심히 공부한 최형섭은 고국에 봉사하고자 귀국했다.
최형섭은 원자력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상공부 광무 국장을 겸임했다. 1962년 국영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 금속연료종합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는 상공부 광무국장을 그만둔 뒤에 원자력연구소장을 맡으며 낮에는 소장 일을 하고 밤에는 금속연료종합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했다고 한다.
1966년 최형섭은 한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종합과학연구소인 KIST 초대 소장으로 임명된다. 한국의 과학연구개발은 최형섭에 의해 시작됐던 것이다. 최형섭에게 가장 큰 문제는 연구원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는 국내에서 연구원을 충당할 때 국내 기업과 대학의 연구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외에 있는 한국인 인재를 유치하기로 했다. 만약 그가 국내에서 손쉽게 인재를 구했더라면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사로 볼 때 마이너스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최형섭 소장은 미국과 유럽의 해외 연구기관들에 KIST 안내서를 보낸 결과 500여 명이 응모했고 그 가운데 18명을 뽑았다. 이들 18명의 유치 과학자는 형편없이 낮은 급여 수준과 열악한 연구 환경을 감수하고서 오직 조국에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귀국행을 선택했다.
KIST는 주로 기업의 용역을 받아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주고, 외국의 기술을 기업의 실정에 맞게 개량해서 제공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했다. KIST는 조선과 철강, 자동차 등 주요 기간산업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책 자료를 수집하고 작성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경제관료들의 의욕은 활화산처럼 타올랐기 때문에 KIST의 업무는 과중할 수밖에 없었다. 18명의 초기 멤버들 중 5명은 격무에 시달리다가 귀국 후 3~4년 이내에 큰 병을 얻어 숨졌다고 전한다.
KIST를 안정적 기반 위에 연구개발 기능을 정상화한 최형섭 소장은 1971년 과학기술처 장관에 임명됐다. 그의 재임 7년 6개월간 한국의 과학기술 초석들이 하나씩 놓아졌다.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을 제정했다. 국가기술자격법도 만들었다. 또 한국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한국과학원을 설립했다. 한국과학원과 KIST는 나중에 통합돼 KAIST로 탄생된다.
최형섭 장관 재임 시기에 한국표준연구소, 한국전자기술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등 정부출연구소가 잇달아 설립됐다. 1977년에 기초과학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과학재단을 설립했다. 한국과학재단은 훗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과 통합돼 한국연구재단으로 발전한다. 최형섭 장관은 대덕연구단지 구상을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추진했다. 오늘날 한국 과학기술의 총 집산지인 대덕연구단지의 조성에서 최형섭의 공로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뮌헨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재관 박사는 서독의 철강 기업인 데마크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김재관 박사는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한국철강산업 육성 방안’을 작성해 한국 정부에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 12월 차관을 얻고자 서독을 방문했다. 박 대통령과 유학생들의 만남에서 김재관 박사는 대통령에게 자신의 철강산업 육성 방안을 전 했다.
박 대통령은 김재관 박사를 잊지 않고 있다가 1967년 KIST 해외유치과학자의 일원으로 불러들인다. 김재관 박사는 KIST에 있으면서 포항제철 설립 등 중화학공업 육성 추진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나라의 처음 종합제철소 건설안은 타당성 부족으로 세계은행으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다. 김재관 박사는 이 사업계획을 새로 작성하는 업무를 맡아 당초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이렇게 마련된 계획안은 포항제철소 건설에 필요한 청구권 자금 제공자인 일본 측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당시 김재관 박사는 종합제철소 건설 분야의 국내 유일의 전문가로서 포항제철 생산능력이 10배로 커진 20년 뒤에도 기존 공장에서 생산을 지속하면서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김재관 박사는 중화학공업화 추진의 시발점이 됐던 ‘한국 기계공업 육성 방안’ 작성에도 깊이 간여했다. 김 박사는 이 육성안에서 주물선 공장, 특수강 공장, 중기계 공장, 조선소 등 4대 핵심 공장 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총 1,350페이지 분량의 ‘중공업 발전의 기반’이란 보고서를 책임 작성했다.
김재관 박사는 1972년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을 거쳐 1973년 1월 상공부 중공업 차관보로 임명됐다. 그는 중공 업 차관보로 있으면서 자신이 KIST에 있을 때 작성했던 ‘표준형 차체 개발사업 기획서’를 토대로 ‘장기 자동차 공업진흥계획’을 작성했다. 이 계획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유 모델을 생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유 모델을 관철시키기 위해 박 대통령을 직접 설득했고 결국 허락을 받아냈다.
대통령으로부터 고유 모델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당시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는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 김재관 차관보는 마지막으로 당시 신생 회사인 현대자동차의 정주영 회장과 정세영 사장에게 제안해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한국 자동차의 고유 모델인 포니는 1976년 정식으로 판매가 개시됐고 10년 뒤인 1986년에 미국 시장으로 진출했다. 이들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 오늘날 현대기아차 그룹은 세계 3대 자동차 메이커로 우뚝 섰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