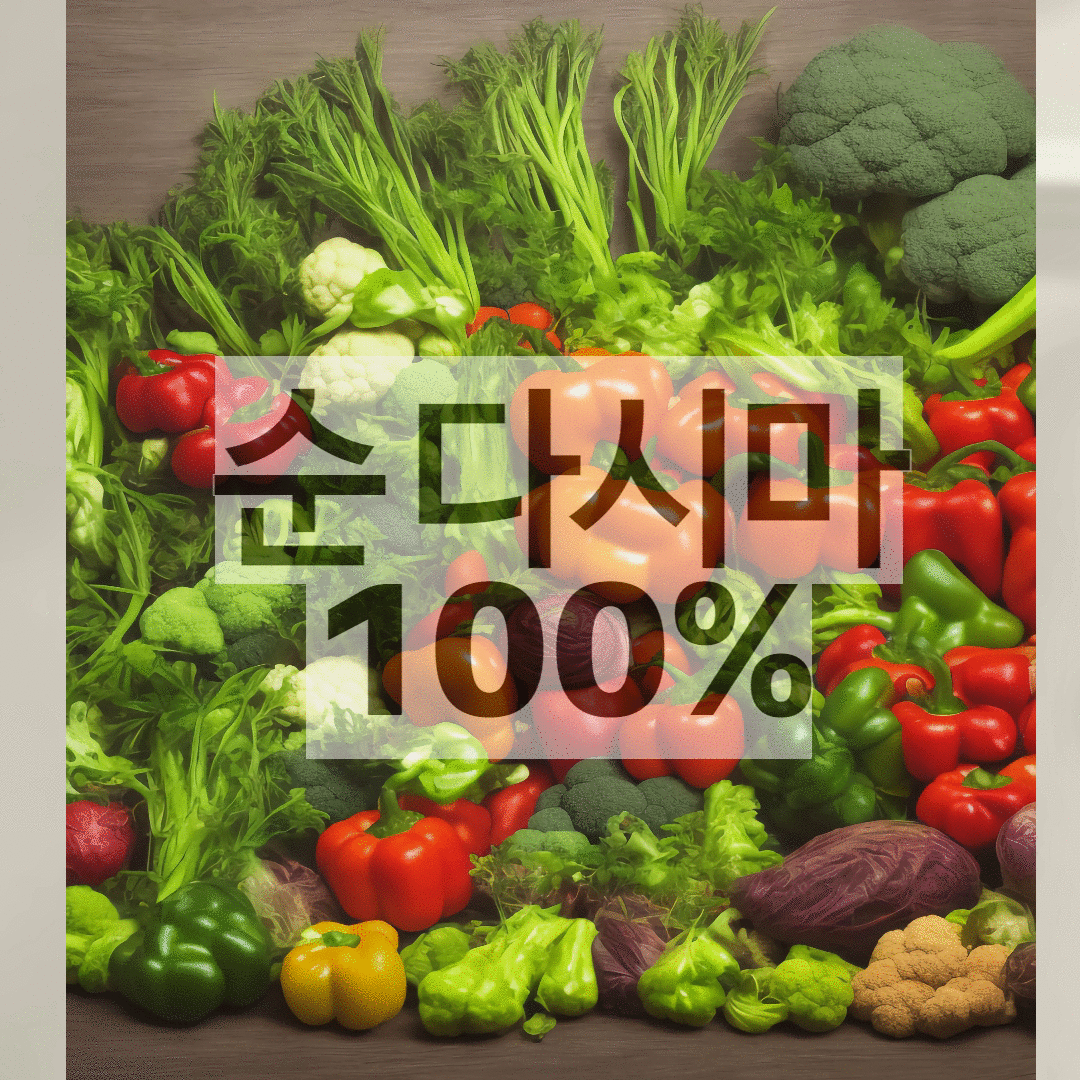행복교육은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키워드이다. 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우리 교육이 행복하지 않아서 행복하게 한다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보다 더 행복한 교육을 만들겠다는 각오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보다 국민 누구나 기회를 보장 받고 그 결과를 누구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을 하겠다는 정부의 교육철학으로 해석하고 싶다.
사전적인 의미로 행복은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를 말한다. 물질이 아니라 한 사람이 느끼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이다. 그러므로 교육제도를 만들고 교육개혁을 하여 왔던 정치철학이나 정책입안자의 눈높이로 평가하는 가치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느낄 때이다.
세계에서 자기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믿는 아주 재미있는 나라가 있다. 히말라야 산맥에 둘러싸인 부탄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이다. 전체인구가 우리나라 안산시 정도로 70만 명을 겨우 넘는다. 정보통신산업이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농업이 대부분이고 산업이라고 해봐야 국토가 히말라야 산맥에 둘러싸여 있는 특성상 지형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여 인도에 수출하는 정도이다. 1인당 국민소득도 우리나라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교육적으로도 특별한 것이 없다. 국민의 반수는 글을 읽지 못하고, 교육비 전액이 무료라고는 하지만 초중등교육에 진학하는 비율도 높지 않다. 그런데 왜 부탄국민들은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국민총행복이 국가 경쟁력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을 얘기할 때 인구규모니 군사력이니 경제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대체적으로 GNP(국민총생산 : Gross National Product)가 기준이 된다. 그런데 부탄은 GNP대신 GNH(국민총행복 : Gross National Happiness)라는 지수를 만들어 국가의 목표로 하고 있다. GNH를 만들어 발표한 것은 1970년대이지만 1999년에 발표한 중장기 국가의 방향성을 담은 ‘부탄 2020’에서는 GNH를 중심적인 개발개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 정량적 가치에 익숙해 있는 우리에게는 꿈같은 목표라고 생각되겠지만 과연 국민행복 부문에서 부탄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부탄은 2005년에 GNH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매우 행복함’(Very happy), '행복함‘(Happy), ’행복하지 않음‘(Not very happy) 등 세 항목을 외국인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제시하였는데 행복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97%였다고 한다. 그 이후로 부탄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의 대명사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몇몇 도시도 벤치마킹 등 연구대상으로 한 적이 있다고 한다. 마침 주변에 부탄을 오랫동안 연구하여 그 나라 사정을 잘 아는 지인이 있어 “부탄은 정말 행복한 나라인지”를 물어보았다. 부탄의 교육을 잘 알고 있기도 하지만 여러 차례 연구차 부탄을 다녀오고 정부관계자도 잘 알고 있어 흥미로운 대답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나의 예상과는 달리 그는 “부탄은 다른 나라들이 행복한 나라라고 칭찬해 대는 통에 피곤해한다”는 부탄 국내의 반응과 함께 지그미 틴리(Jigmi Y. Thinley) 전 부탄총리가 2012년 4월에 유엔에서 한 연설문을 보내주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부탄은 국민행복지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중략)....
우리는 사회 변화의 목표로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인 행복을 이루는 것이다(I wish to submit that, contrary to what many mistakenly believe, Bhutan is not a country that has attained GNH......What separates us, however, from most others is that we have made happiness, the most fundamental of human needs as the goal of societal change). 최고의 정책 결정자가 외부의 찬사에도 겸허해 하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은 아닐까? 정책결정자가 조그만 성과도 더 치장하는데 익숙할 때에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것을 외면하기 쉽다는 아주 당연한 대답을 작은 나라 부탄에서 얻을 수 있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 교육은 행복할까?
우리나라 교육은 선진국이 즐비한 OECD 국가 가운데에서도 알아줄 정도로 높은 양적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진학률이 거의 100%다. 대학진학률도 80%를 넘는다. 우리보다 경제규모도 크고 국민소득도 높고 의무교육 제도도 수십 년이나 일찍 시작한 일본도 교육의 양적 면에서는 우리나라에 뒤진다(6년간의 의무교육은 1900년 초에 완성되었다).
일본의 대학진학률은 50%정도이지만 그것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유학생 수도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12만 명이 넘는데 비해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2.6배가 많은 일본은 3만5천명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일본정부에서는 교육의 국제화를 외치고 유학생 30만 명 유치정책 등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부의 생각대로 잘 되지는 않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처럼 양적으로 성장해 온 이면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지만 민간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의 공로와 국가의 재정형편으로서는 충당하지 못하는 교육비를 아낌없이 보태어온 학부모들의 공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의 교육기회 측면에서만 생각한다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능력은 자녀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즉 지역 간, 계층 간에 교육기회의 격차를 만들어냈다.
정부는 한국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초등학교(당시는 국민학교였다)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국민은 초등학교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가의 재정능력으로는 초등학교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부칠 정도로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은 어려웠다. 따라서 초등학교에 접속하는 상급학교 교육은 가정형편이 받쳐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특권이었다. 결국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이념은 초등교육에 한정적이었다.
1970년대 초의 예를 들어보면, 당시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진학률)이 87%에 이르렀다. 지방의 대도시인 광주도 80%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도서로 이루어진 완도와 진도 등의 중학교 진학률은 겨우 50%대 중반 수준에 머물렀다. 벌써 중학교 진학률에서 30% 정도의 차이가 생겼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대도시의 경우 중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대부분은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완도군의 경우 중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도 겨우 81%만이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중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학교가 없어 20%는 학교를 가지 못하였다는 결론이다. 비록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지만 과거의 이러한 교육격차는 오늘날에도 또 다른 형태로 ‘행복교육’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학력과 스펙이 사회적 지위를 규정하는 잣대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어느 누구도 돈이 없어 대학을 가지 못한다는 푸념이 안 통하는 교육환경이 만들어졌다. 물론 하루 세끼를 걱정하는 가정도 있기는 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대학등록금이 무척 비싸고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학비도 차이가 매우 크다. 미국의 주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학비는 우리보다 더 차이가 크고 일본의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학비의 차이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의 재정으로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들까지도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교육기회는 그만큼 확대되었다고 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교육과 사회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첫째는 학력 그 자체가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점이다. 얼마 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졸자와 고졸자의 신입 임금차이가 약 74만원이라고 한다. 대졸자는 고졸자에 비하여 대학생 한명이 한 달간 아르바이트해서 번 금액만큼을 더 받는 셈이다. 그러나 신입 임금은 단순한 비교 기준일 뿐이다.
어떤 학력과 스펙으로 입사하였느냐는 회사 내의 사회적 지위를 규정하는 잣대가 되어 버린다. 고졸자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인성이 좋고 지성을 갖추더라도 그건 작은 변수에 불과할 뿐이다. 학력은 결혼과 승진 등 인생의 성공을 결정짓는 상수(常數)가 되어 가고 있으며 취업빙하기의 시대에서는 더 고정화되어가고 있다. 즉 학력신분제의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둘째 한사람 능력의 결정이 중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승부에 의하여 갈린다는 점이다. 수학능력시험은 단순히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자격시험이 아니라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를 결정짓는 능력시험이다. 고교 단계의 학업성취를 평가하여 서열화 된 대학에 성적에 따라 차례로 줄을 세우는 시험이다.
그런데 이 한 번의 시험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한방이다. 그러니까 수능시험 한 문제의 정답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게 아닌가 싶다. 물론 기회의 측면에서 생각하면 신분,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농촌에서 공부한 학생이든 섬에서 공부한 학생이든 시험성적이 좋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가장 공정한 제도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이다. 수학능력시험에서 좋은 성취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를 갖추어야 한다.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좋은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의 경쟁력이 필요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소득이 높은 가정에서 더 많은 사교육에 참여하고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셋째 대학을 졸업하였다고 모두 평등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고교를 졸업한 학생의 80% 이상이 진학을 하는데 대학을 졸업하면 전부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대학을 가는 학생은 얼마나 될까? 그저 대학을 졸업하여야 최소한의 대우를 받는 학력신분제 사회이므로 그냥 가고 볼일이다. 이미 취직빙하기에 접어들어 버렸는데 취직도 그만큼 녹녹하지가 않다. 대학을 졸업해도 고졸자가 하는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이 요즘의 취업실태이다. 이런 사회구조에서 출신학교가 취직을 결정짓는 취업경로는 명시적이건 암묵적이건 존재 하게 된다. 결국 일부 대학의 멤버십 주의에 경쟁력을 상실한 명목적 대학이 우리 주위에 많을 뿐이다.
하게 된다. 결국 일부 대학의 멤버십 주의에 경쟁력을 상실한 명목적 대학이 우리 주위에 많을 뿐이다.
서두에서 소개했지만 부탄은 다른 나라들이 너무 행복한 나라라고 칭찬해 주어 피곤해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행복지수를 다시 조사해 보니 41%밖에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겸손해 한다. 또 국가의 최고 경영자인 총리조차도 국제사회에서 “부탄은 국민총행복지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라고 겸손해 하고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다. 부탄의 사례가 ‘행복교육’의 답을 찾아가는 실마리는 되지 않을까 싶다.
MeCONOMY Magazine January 2015